
Essay
이슈에 관한 다양한 오피니언을 엿봅니다
«비애티튜드»가 귀히 모시는 에세이 필자인 김도훈 님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하는 칼럼니스트이자 영화평론가입니다. 여름철에 들이닥치는 다양한 영화 시사회에 다녀오느라 요즘 무척 바쁜 몸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신작 영화에 대한 리뷰를 부탁하려고 했는데요. 의외로 그의 대답은 ‘노no’. 알고 보니 얼마 전 뉴스에 뜬 자비에 돌란의 은퇴 소식에 대한 글을 쓰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답니다. 김도훈 작가가 기억하는 돌란은 어떤 모습일까요? 돌란의 은퇴를 믿지 않는다는 그의 이야기를 아티클에서 확인해 보세요.
영화감독 자비에 돌란Xavier Dolan을 만난 적이 있다.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만난 건 아니다. ‘만났다’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 마디라도 나눴다는 뜻이니까 말이다. 나는 그를 먼발치에서 본 적이 있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봤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다. 나는 돌란을 가까운 발치에서 봤다. 한 5m 거리 정도?
2010년이었다. 영화잡지에서 일하던 나는 칸 영화제(Festival de Cannes)로 출장을 갔다. 임상수 감독의 ‹하녀›와 이창동 감독의 ‹시›가 동시에 경쟁 부문에 오른 해였다. 홍상수 감독의 ‹하하하›는 일종의 2차 경쟁 부문이라 할 법한 ‘주목할 만한 시선’에 출품됐다. 한국 영화가 경쟁 부문에 오르면 칸 해변에도 한국 기자들이 많아진다. 결국 이창동 감독이 각본상을 받고, 홍상수 감독이 ‘주목할 만한 시선상’을 받았다. 흥겨운 해였다.
사실 내가 가장 보고 싶은 영화는 따로 있었다. 돌란의 ‹하트비트Heartbeats›였다. 이 영화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와 함께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대됐다. 나는 칸 영화제에 가기 전 돌란의 데뷔작인 ‹아이 킬드 마이 마더I Killed My Mother›(2009)를 봤다. 엄마를 죽여버리고 싶은 16살 게이 소년의 이야기였다. 에너지가 굉장했다. 영화는 엄청 거칠고, 서툴고, 직설적이었다. 그게 매력이었다. 나는 데뷔작부터 지나치게 유려하게 만드는 감독보다 뭔가 좀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도 뺨을 후려치는 것 같은 치기를 지닌 감독을 좋아하는 편이다. 돌란이 딱 그랬다. 영화가 끝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부산 사투리로 “하따 이 새끼 보소”라고 내뱉은 기억이 난다. 나는 마음에 드는 영화를 보면 저절로 사투리가 튀어나오는 경향이 있다. 나에게는 서울 사투리보다 좀 더 본능적인 언어라 그럴 것이다.

‹하트비트Heartbeats›, 2010 (좌)
‹아이 킬드 마이 마더I killed My Mother›, 2009 (우)

‹아이 킬드 마이 마더I killed My Mother›, 2009 © FILMGRAB
슬프게도 나는 칸 영화제에서 ‹하트비트›를 보지 못했다. 대신 함께 출장을 갔던 김혜리 기자가 봤다. (선배라고 썼다가 호칭을 기자로 바꾼 이유는, 요즘 아이돌까지 공식 석상에서 선배 선배 거리는 게 영 마뜩잖기 때문이다.) 김혜리 기자를 보자마자 물었다. “어땠어요?” 나는 아직도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마음에 들지 않는 영화를 봤을 때 그분 특유의 어떤 표정이 있다. 나는 그 표정을 두 번 더 겪었다. 한 번은 소피아 코폴라의 ‹마리 앙투아네트›를 보고 나오던 중 “선배 이 영화 너무 좋지 않아요?”라고 했다가 목격했다. 또 한 번은 첫 번째 ‹토르› 영화를 보고 나오던 중 “저는 지금까지 나온 마블 영화 중 이게 제일 좋네요”라고 했다가 목도했다. 절대적으로 인자하지만, 어쩐지 근심이 서려 있는 그 표정. 나는 기대를 접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생각이 바뀌었다. 영화제 기간 중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돌란을 봤다. 내가 간 식당 바로 옆 파티오에 앉아서 몇몇 힙스터 친구들과 밥을 먹고 있었다. 당시 그는 영국 록 스타 모리세이Morrissey처럼 앞머리를 무스와 스프레이로 단단하게 치켜올리고, (마치 알프스의 마터호른 같았다) 가슴까지 파인 하얀 티셔츠를 입고, 저게 어떻게 사람 몸에 들어가나 싶은 검은 스키니진을 입고, 굽이 앞머리처럼 높은 가죽 부츠를 신고 있었다. 나는, 반했다. 아니. 돌란은 어떻게 봐도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반했다. 그러니까 이건 뉴진스의 ‹어텐션Attention› 뮤직비디오를 보고 민지에게 반한 것처럼 반한 것이다. 뭔가 아름다운 존재를 목격했을 때 나오는 당연한 반응이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 ‹하트비트›가 별로여도 나는 이 남자를 계속 좋아하겠구나.

Photography by Denis Makarenko © Shutterstock
잠깐만. 지금 혹시 외모 때문에 감독의 팬이 됐다고 고백하는 거냐고? 아니, 솔직히 좀 그러면 어떤가.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만든 감독이 외모까지 잘 생기면 좀 더 애정을 갖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솔직히 생각해 보시라. 나는 폴 토머스 앤더슨Paul Thomas Anderson이 잘 생겼기 때문에 그의 영화가 더 좋아 보인다고 말한 동료 평론가도 한 명 알고 있다. 한 사람의 팬질이 꼭 예술적인 이성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세세한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외모도 그중 하나다. 그리고 나는 ‹하트비트›가 생각만큼 나쁘지 않았다. 욕망의 대상이 되는 금발의 남자 주인공을 자기보다 덜 멋있는 사람으로 캐스팅한 덕에 돌란의 예쁨은 유독 빛이 났다. 아주 반짝반짝거렸다.
다만 감독으로서 그의 커리어에 그리 큰 기대를 걸진 않았다. ‹아이 킬드 마이 마더›는 아마도 젊고 치기 어린 감독이 어쩌다가 내놓은 근사한 데뷔작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트비트›는 예쁜 영화지만 데뷔작처럼 좋은 영화는 아니었다. 그런데 ‹로렌스 애니웨이Laurence Anyways›(2012)를 보고 나는 내 뺨을 후려치고 싶었다. 돌란은 이르게 스타가 된 자신을 카메라에 담지 않고 카메라 뒤로 빠지는 선택을 했다. 멜빌 푸포Melvil Poupaud가 트랜스젠더를 연기하는 이 영화는 무려 3시간에 달하는 유미주의적 영화 만들기의 극치였다. 당시 영화잡지에서 일하던 나는 이렇게 20자 평을 썼다. “자비에 돌란은 과대 평가된 힙스터 감독인가? 이 영화는 그 모든 의심에 대한 당돌한 대답이다. 종종 예술적 허세가 폭발하는데, 이렇게까지 허세를 극단으로 밀어붙이니 두손 두발 다 들고 투항하게 된다.” 그렇다. 나는 투항했다.

‹로렌스 애니웨이Lawrence Anyways›, 2012

‹로렌스 애니웨이Lawrence Anyways›, 2012
스릴러 영화 ‹탐엣더팜Tom at the Farm›(2013)과 ‹마미Mommy›(2014)를 거치며 그의 영화는 정말 놀랄 정도로 빠르게 진화했다. ‹마미›는 여러 부분에서 데뷔작인 ‹아이 킬드 마이 마더›의 연장이었다. 감정은 더욱 격렬한데 솜씨는 더욱 단아해졌다. 아마도 이 글을 읽는 많은 분은 ‹마미›의 바로 ‘그 장면’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1:1 비율의 정사각형 프레임에 갇혀 있던 주인공이 록 밴드 오아시스의 ‘원더월Wonderwall’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양손으로 화면을 열어젖히는 바로 그 장면 말이다. 솔직히 이런 형식적 실험 혹은 장난은 잘못 사용하면 유치하기 짝이 없게 마련인데, 유치하지 않았다. 아니다. 솔직히 유치했다. 그런데 그 유치한 진심이 꽤 감동이었다. 그건 어떤 면에서 오로지 돌란처럼 약간 자신의 재능에 취한, 그러나 확실히 재능이 절정으로 치닫는 젊은 감독만이 해낼 수 있는 영화적 치기였다. 나는 그 치기가 어디까지 더 갈 수 있는지 지켜보고 싶었다.

‹탐앳더팜Tom at the Farm›, 2013
‹마미Mommy›,2014
‹탐앳더팜Tom at the Farm›, 2013 (좌)
‹마미Mommy›,2014 (우)
사실 나는 이 글을 조금 슬픈 마음으로 쓰고 있다. 돌란은 얼마 전 스페인 매체 «엘 문도El Mundo»와의 인터뷰에서 영화 제작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술은 쓸모가 없고 영화에 전념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말했다. 단호한 워딩은 순식간에 인터넷 세계로 퍼져나갔다. ‘자비에 돌란이 은퇴를 선언하다’라는 제목을 달고 퍼져나갔다. 며칠 뒤 돌란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인터뷰를 정정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통역을 거치며 잘못 일반화된 부분이 있다며 “영화를 그만 만들고 싶다고 말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예술은 쓸모가 없고 영화에 전념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계속해서 TV 시리즈 등을 만들 가능성은 열어두고 싶다고 했다. 사실 이 해명은 조금 이상했다. 영화를 더는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는 점에서 결국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직접 연출한 ‹The Night Logan Woke Up›에 배역으로 출연한 자비에 돌란
며칠 뒤 «엘 문도»는 인터뷰 오디오 녹취를 공개한 뒤 “자비에 돌란이 애초 언급했던 내용과 일치한다”며 반박을 내놓았다. 굳이 이런 반박을 내놓을 필요가 있나 싶지만, 나는 오히려 좋았다. 돌란이 자신의 발언을 후회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꼭 자기가 한 모든 말을 지키고 살아야 할 필요는 없다. 막상 인터뷰를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정신 좀 차리라”며 전화했을 수도 있는 일 아니겠는가. 내가 그의 친구였다면 곧바로 퀘벡에 전화를 걸어 “마음이 불안정할 때는 제발 인터뷰 같은 거 하지 마”라고 쏘아붙였을 것이다. “칸 영화제의 기억은 제발 좀 잊어버리라”고도 말했을 것이다. 나는 영화 만들기에 대한 그의 순간적 혐오가 분명 마지막 두 영화에서 얻은 경험에 기인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2016년 돌란은 ‹단지 세상의 끝›으로 칸 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받았다. 문제는 이 영화가 어떻게 봐도 그의 최고작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영화제 기간 중 매체들이 내놓는 별점은 경쟁작 중 최악이었다. 나 역시 그리 좋아하는 편은 아니다. 스물일곱의 돌란이 조금 더 성숙한 영화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형식적 재주를 모조리 제거한 느낌이었다. 그런 와중에 큰 상을 받자 스캔들이라고 일컬을 만큼 비난이 터져 나왔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던 매즈 미켈슨Mads Mikkelsen이 울면서 수상소감을 말하는 자비에 돌란을 멍하게 바라보는 장면은 밈이 되어 인터넷을 떠돌기 시작했다. 아직 한국에 공개되지 않은 영어 데뷔작 ‹존 F. 도노반의 죽음과 삶›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혹평받았다. 로튼토마토 평점을 다 믿는 건 곤란하지만, 신선도 19%는 아무래도 좋은 소식이 아니다. 2019년 작 ‹마티아스와 막심›은 모든 국가에서 처참한 흥행 성적을 거뒀다. 그래도 나는 이 영화가 자신의 세계를 견지하면서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일종의 이정표라고 생각했다. 그래.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런데 어랍쇼? 은퇴 선언을 해버렸다.

‹마티아스와 막심Matthias et Maxime›, 2019
나는 자비에 돌란의 은퇴 선언을 믿지 않는다. 믿지 않을 생각이다. 마지막 두 영화가 비평적, 흥행적으로 실패를 거둔, 이제 갓 서른이 된 예민한 예술가의 말은 믿을 게 못 된다. 왜냐하면 마흔 중반의 나는 서른쯤의 나이를 이해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두 번의 위기를 겪는다. 첫 번째가 서른이고 두 번째가 마흔이다. 마흔이 중년의 위기라면 서른은 정체성의 위기다. 마흔은 정신과 육체가 마침내 절정을 넘어서서 기울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끼는 단계다. 더는 젊은이로 불릴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하는 순간이다. 더는 새로운 것에 도전할 여유도, 시간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아직 마흔이 되지 않았다면, 축하한다. 아직 인생 최악의 정신적 위기는 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서른은? 사람이 다시 중2병에 접어드는 단계다. 이팔청춘도 지났으니 이제 뭔가 제대로 된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이 길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럴 때 마흔이 넘은 나 같은 늙은이가 할 수 있는 조언은 하나다. 그냥 자기를 믿고 밀어붙이라는 것이다. 꾸준히 밀어붙이는 것보다 현명한 방법은 사실 몇 없다. 아니, 갑자기 글이 꼰대의 인생 조언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글은 썩 좋지 않다. 그러니 마지막은 다시 돌란의 이야기로 돌아가겠다.
만약 당신이 나처럼 삐뚤어질 정도로 돌란의 열성적인 팬이라면 지레 은퇴를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는 결국 다시 영화를 만들게 될 것이다. 어쩌면 더 나은 영화를 만들 것이다. 사람이 한 번 은퇴한다고 선언했다가 슬그머니 복귀할 때는 자기 인생 최고의 것을 내놓을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돌란이 계속 “여전히 감성만 가득하고 무게감이 없다”고 비평가가 불평하는 영화를 만드는 힙스터 예술가로 늙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뭐 어떤가. 인생은 길다. 그리고 불공평하다. 모든 사람이 항상 더 성장하며 더 나은 걸작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는 법도 없다. 나는 육십이 되어서도 ‹마미›의 그 장면을 다시 보며 울컥할 것이다. 그거면 충분하다.
Writer
김도훈은 작가, 칼럼니스트, 영화평론가이다. 영화주간지 «씨네21»,남성지 «GEEK»과 «허프포스트코리아»에서 일했다. 에세이집 『우리 이제 낭만을 이야기합시다』를 썼다.
@closer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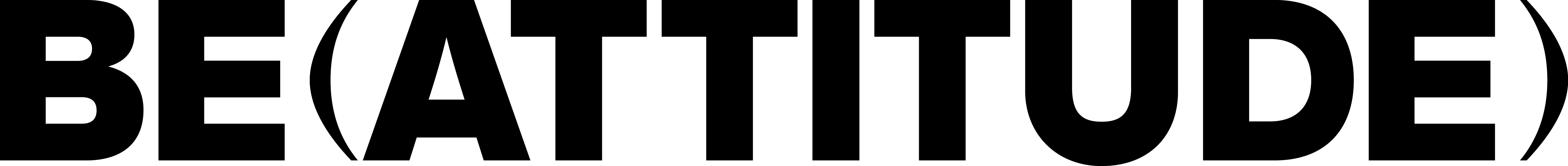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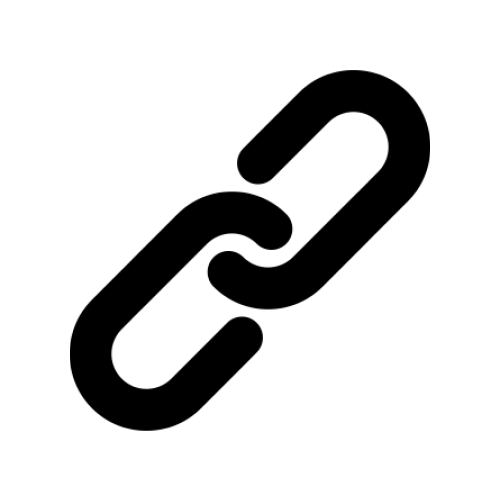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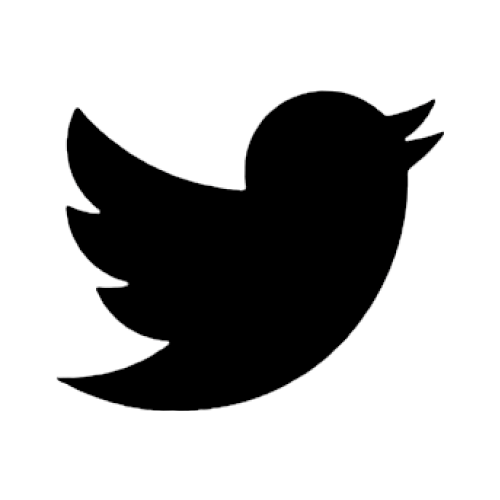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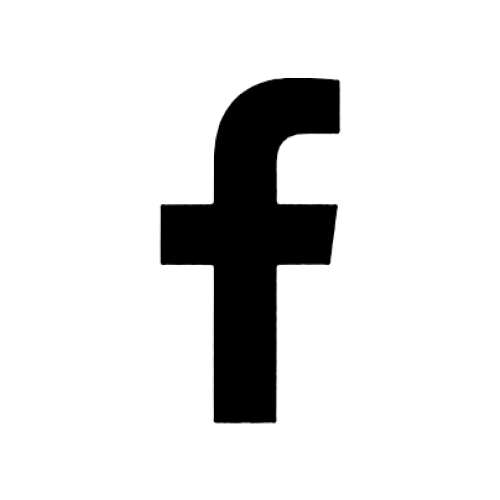


![[BA]김재원 섬네일](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10/BA%EA%B9%80%EC%9E%AC%EC%9B%90-%EC%84%AC%EB%84%A4%EC%9D%BC-scaled.jpg)
![[BA]섬네일(0602)](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06/BA%EC%84%AC%EB%84%A4%EC%9D%BC0602-scaled.jpg)




![[BA]섬네일](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6/02/BA섬네일-5-400x600.jpg)
![[BA]섬네일](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6/02/BA섬네일-4-400x60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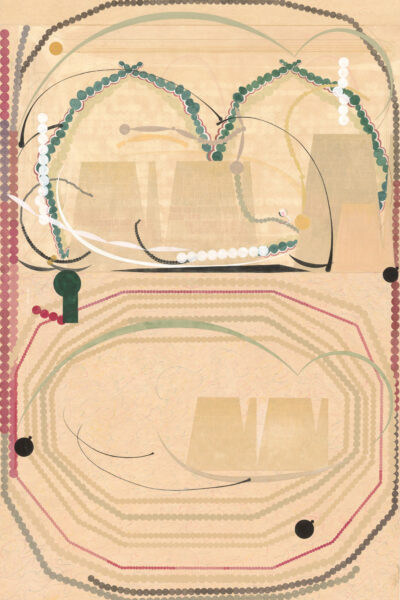
![[BA]섬네일](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6/02/BA섬네일-3-scaled.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