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bor of love that was mixtapes. Original photo by André
길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어폰을 끼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걸어다니곤 한다.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모든 걸 접하고 연결되는 게 일상이 된 덕분이다. 심지어 이제는 이어폰에서 선도 사라졌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음악을 듣는 방법에 따라 여러 기계가 존재했다. 그 기계를 관리하는 게 일이었던 시절, 목표는 동일했다. 일상에서 자기만의 세계로 빠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과거에 존재했던 카세트 플레이어와 MP3플레이어를 소개해보려 한다. 통로마다 각자 다른 세계가 펼쳐졌고 디자인 스토리와 음악 감상법도 제각각이었다. 음악에 대한 내 감성 혹은 문화에 접근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끼친 기계들. 음악과 문화를 소비하는 방법을 유도하며 취향과 소비 방식에 변화를 야기하던 물건들이다.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아련히 회상하는 회고적인 글을 작성하게 됐을까? 최근 Z세대 사이에서 레트로 감성이 유행하면서 새롭고 신기한 눈빛으로 옛 기계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늘고 있다. 디지털 스트리밍 시대에 이런 고지식한 기계가 신기할까? 파도가 다시 잔잔하게 다가오는 현상을 고민하면서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풀어보려 한다. 뭐, 꼰대가 자기 얘기하고 싶은 거다.

Sony Walkman TPS-L2. Original photo by Grant Hutchinson.
파트1 – 믹스 테이프 로맨스
지난 학기에 어떤 학생이 ‘레트로 마켓’ 콘셉트로 과제를 해왔다. 나는 이걸 보자마자 갑자기 확 늙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감정도 잠시, 온라인 편집숍을 꾸미는 그가 이런 ‘데드 미디어dead media’에 관심이 있다면서 막상 구매를 하지 않고 옛 기계들을 탐험하고 모으는 스크랩 콘셉트로 진행하려는 게 아닌가. 그는 기계가 지닌 기능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묻고야 말았다. “왜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 그는 대답했다. “교수님, 저는 이런 기계들의 디자인에 끌려요.” 아, 아날로그 기계를 실제 작동하는 경험을 하지 못했으니 당연히 겉모습만 보게 되는구나. MP3 플레이어, MD 레코더, 아날로그 TV, 그리고 카세트 플레이어의 버튼을 눌러본 적 없는 사람에게 기능에 대한 감각이 제로인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나는 이런 기계에 대한 경험과 기억이 아직도 선명한걸.
요즘 Z세대가 제일 관심을 보이는 기계는 소니에서 처음 만든 워크맨일 거다. Sony Walkman TPS-L2. 1979년에 출시된 워크맨은 당시 150달러 정도로 판매되었는데 나오자마자 큰 히트를 쳤고 사람들이 음악을 감상하는 데 커다란 변화를 주었다. 말 그대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었지. 지금이야 모두들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지만, 당시 집 혹은 자동차에서만 듣던 음악을 길거리를 걸으면서 즐길 수 있게 만든 제품이 바로 워크맨이었다. 이후 수많은 음악 감상 기기가 출현했고 애플의 iPod도 있지만 소니 워크맨은 시조새 레벨이다. “중요한 사실은 소니 워크맨이 출현하기 전까지 개인 휴대음악은 인류 역사상 거의 존재한 적이 없다는 거다.” 생각을 거듭할수록 정말 놀라운 발전이었다.
워크맨 덕분에 소니는 지금의 브랜드 위상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워크맨이 음악 청취 기계로서 스마트폰에게 완전히 밀린 지금도 워크맨을 놓지 못하고 있다. Sony Walkman TPS-L2는 가로 90mm, 세로 150mm, 폭 35mm에 무게는 500g이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크기다. 아주 큰 휴대폰 보조 배터리보다도 더 큰 사이즈다. 워크맨을 사면 음악의 세계로 진입하는 헤드폰이 함께 따라왔다. 워크맨에는 두 사람이 함께 음악을 듣는 기능이 있었는데 특히 헤드폰을 끼고 있으면서 서로 소통하는 ‘핫 라인’ 기능이 존재했다. 같이 걸어가며 음악을 크게 듣다가 어떤 버튼을 누르면 기계에 달린 마이크를 통해 워키토키처럼 말을 주고 받을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웃긴 기능이지만 워크맨을 만든 소니의 공동 창업자 마사루 이부카의 음악 사랑이 온전히 표현된 결과다. 이 혁신적인 기기는 파랑과 실버 조합의 케이스가 참 예뻤다. 그렇지만 내 첫 워크맨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다.

Sony Walkman WM-FX413. Original photo by Jay Wood.
나에게 찾아온 첫 워크맨은 FM/AM 라디오가 달려 있는 미니 탱크였다. 물론 Sony Walkman TPS-L2 보다 작았지만, 그다지 디자인이 잘 된 물건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이 워크맨을 매우 사랑했다. 워크맨을 통해서 내 청춘을 지배했던 음악을 끊임없이 들을 수 있었다. 물론 배터리가 끝나거나 테이프가 늘어지면서 재생이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땐 불가능했지만. 그런데 사실 내가 카세트를 듣던 때는 워크맨 시대가 아니라 CDP 시대였다. 무거운 워크맨을 들고 다니며 노스탤지어를 느끼는 힙스터 짓에 빠진 상황이 아까 말한 내 학생이랑 동일했던 거다. 그럼 나는 한창 CDP가 유행하던 1999년 왜 카세트를 선호하게 됐을까? 주변 친구들은 열심히 CDP를 즐길 때 구식 디바이스를 차고 다녔던 이유는 바로 펑크 음악 때문이었다.
당시 나는 한국에서 외국인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1999년은 아직 광케이블 인터넷이 널리 퍼진 상태가 아니었고 MP3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나와 친구들이 서구권에서 유행하는 음악을 들으려면 이상한 타임 버블을 겪어야 했다. 늘 3~4년 늦게 정보를 접하다 보니 여름 방학마다 미국에 가면 그때 구입할 수 있는 음반들을 모조리 사서 내내 듣고 공유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몇몇 친구들은 기능 좋은 컴퓨터로 CD를 구워줄 수 있었지만 극히 소수였다. 그때 카세트 플레이어의 기능이 내 삶에 폭탄처럼 떨어졌다. 바로 레코딩 기능이다! 당시 거의 모든 가정 집에는 부모님들이 클래식 음악을 듣던 CDP와 카세트 데크가 있었다. 친구들이 음반을 빌려주면 나는 바로 거실에 앉아서 수많은 음악들을 카세트 테이프로 옮기는 작업을 했다. 비싼 컴퓨터를 구입할 필요 없이 재생 버튼과 멈춤 버튼을 요리조리 누르면서 나만의 사운드 트랙을 구성할 곡을 하나하나 고르면서 정리했다. 내 취향대로 곡을 선정해 노래를 담는다는 건 진정 신비한 일이었다.
우리 학교 학생의 60%는 나처럼 교포였다. 근데 펑크 음악에 관심이 없었다. 이걸 함께 즐기고 서브 컬처를 만들고 싶어 하던 학생들은 대부분 찐 외국인이었다. 나는 그들과 어울리며 펑크를 배워갔다. 그중 나보다 한 3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매우 친절한 펑크의 전도사처럼 내게 많은 음반을 빌려줬다. 그는 매우 쿨했다. 가죽 재킷을 입고 다니면서 수많은 밴드를 소개해줬다. 스캥킹 피클Skankin’ Pickle, 오퍼레이션 아이비Operation Ivy, 더 미스터 티 익스피리언스The Mr. T Experience, 프로파간디Propagandhi, 그리고 더 퀴어스The Queers까지. 그가 즐기던 펑크는 널리 알려진 강력한 4코드 펑크보다 더 부드럽고 감성적이며 달달했다. 매주 있던 펑크 수업은 내가 형에게 음반을 빌리며 진행됐다. 이런 교육은 인생에 몇 번 없는 경험을 선사하는데, 이를 기록하게 도와준 친구가 바로 워크맨이었다. 그 많은 음반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곡들을 담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들을 수 있었다. 게다가 스킵 기능이 필요가 없었다! 매주 음반을 받아들고 마치 숙제처럼 고르고 듣고 다녔다. 진짜 상호작용이 있는 수업이었다. 그 형의 컬렉션을 들으며 나는 ‘하트 브레이킹 송’을 모았다.
여기서 카세트 플레이어의 로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바로 ‘사랑의 믹스테이프’다. 감정을 표하는 믹스테이프는 일종의 공예품에 가까웠다. 곡의 가사를 통해 마음을 표현하며 30~60분짜리 마스터피스를 만드는 건 매우 창의적인 행위라고 기억한다. 이건 꽤나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나의 마음을 들을 수 있을까?’, ‘너무 과하게 전달하는 건 아닐까?’, ‘내 취향을 좋아할까’ 등의 경계를 잘 타면서 마음을 똑똑하게 담아야 하는 창작물이었다. 가끔 재미있는 노래를 넣어 그를 기쁘게 만들며 마스터 DJ처럼 감정을 쿨하게 조절하고 정리해야 했다. 많은 테이프를 만들고 그중 선별한 믹스테이프를 전달했으니, 내가 날린 큐피트의 테이프에는 나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다.
요즘은 사람들이 플레이 리스트를 공유한다. 나도 몇 번 만들어봤지만 믹스테이프와는 천차만별이다. 물리적인 물건에 마음을 담아 실제로 전달하는 오브제와는 비교할 수 없다. 곡을 선정하고 고르는 과정은 서로 비슷할지 몰라도, 믹스테이프는 모든 곡을 끝까지 들어야 한다. 테이프로 녹화하는 건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손글씨로 라벨을 쓰면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행위의 정점에 도달하게 된다. 시간을 투자해 음악과 더 가까워지면 더 많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곡을 선택하고 모으는 과정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물론 지금까지의 얘기가 어떤 꼰대의 옛 기억일지 모르지만 이런 특징이 미디어 간의 차이를 만든다. 스트리밍 음악과의 차별점을 생각하며, 다들 한번 카세트 플레이어를 구입해 경험해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믹스테이프를 전달해보자!

Sony MD Player MZ-R30. Original photo by rockheim.
참고로 나는 카세트 플레이어와 오래 사귀었지만, 잠시 바람을 피운 적이 있었다. 1990년도 후반에 MD 플레이어가 유행을 타기 시작했다. MD 플레이어를 보자마자 나는 한눈에 반했다. 카세트 플레이어의 기본적인 기능은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고화질의 디지털 사운드와 더 세련된 모습에. 게다가 CD 플레이어와 달리 흔들려도 음악을 스킵하지 않았다. 녹음도 되고 스킵도 안 하는 디지털 음악 플레이어라니! 게다가 디스크들은 귀엽고 여러 색깔과 종류별로 나와서 매우 예뻤다. 누구나 마음이 흔들릴 대상이었다. MD 플레이어는 예쁘고 기능도 뛰어났지만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일단 디스크가 매우 비쌌다. 고등학생에게는 무리가 되는 액수였다. 평소 디지털 스테레오 음질로 녹음하면 74분에서 160분 정도를 담을 수 있었다. CD랑 비슷했는데 MD는 원래 내용을 지우고 다시 녹화할 수 있었다. 나는 디스크 사는 비용을 아끼려고 모노mono로 녹음을 했다. 이렇게 하면 녹음 시간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나지만, 고화질 디지털 음질이 아니라 아날로그 카세트 음질과 비슷해지는 참사가 생긴다. 그래서 나는 MD 플레이어와 놀 때에도 마음속으론 늘 카세트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MD 플레이어와는 오래 가지 못했다.

The first generation iPod was released October 23, 2001. Original photo by Mark Mathosian.
파트2 – 끝의 시작
나는 2002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때 MP3는 바이러스처럼 퍼지고 있었고 내 여가 시간의 대부분은 MP3 믹스 테이프를 만드는 데 보냈다. 나만의 DJ 이름도 지었는데 완전 창피해서 여기서 공개하지 않겠다.(그건 DeeChae였다.) 부모님에게 졸업 선물로 애플의 ‘아이팟iPod’을 사달라고 했더니 신기하게도 한국까지 배송이 왔다. 이제 나는 방대한 MP3 컬렉션을 그 놀라운 장치에 저장할 수 있게 됐다. 아이팟은 기적의 기기였다. 당시만 해도 아이팟 덕분에 멋진 컴퓨터를 만드는 틈새업체였던 애플이 위기로부터 구출되었지만, 여전히 PC OS로는 윈도우가 최고였다. 그래서 아이팟을 PC에 연결할 때 문제가 생겼고, 게다가 여전히 결함 많은 프로그램인 ‘아이튠즈iTunes’를 Winamp 대신 사용해야 하는 게 골치 아팠다. 그러나 사용성은 여전히 놀라웠다. 스크롤 휠은 혁명적이었고, 작은 벽돌 전자 장치를 휴대하는 데 익숙해지면서 이후 출몰한 스마트폰의 선구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후 미국에서 4년 동안 대학 생활을 하는 내내 아이팟을 사용했는데 새로운 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하드웨어의 스타일과 클래스가 저하되기 시작했다. 저렴한 플래시 메모리 스토리지 바람을 타고 MP3 플레이어 영역으로 진입한 경쟁자들은 넘쳐났다.
곧 MP3 파일 재생 기능은 카 스테레오에서 냉장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포함되었다. 무엇이든 MP3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모든 형태와 크기의 음악을 들을 수 있었다. 가전제품에 MP3 기능을 추가하니 미래적인 디지털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IoT의 전조라 볼 수 있다.
동시에 아이팟은 절대적인 우위를 잃어가고 있었다.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실험했지만 본래 아이팟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측면에서 인터페이스가 모두 엄격했기에 혁신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 아이팟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상상력의 부재가 궁극적으로 제품 카탈로그를 희석시키고 소비자의 관심을 표류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아이팟 미니, 아이팟 나노, 아이팟 셔플(플래시 스틱 셔플은 꽤나 멋졌다)과 같은 다양한 라인을 소개했지만 내 관심은 자연스럽게 바뀌며 다른 브랜드를 살펴보게 됐다.

iRiver iFP-380T 128. Original photo by Timothy Takemoto.
MP3 플레이어 더미에서 의기양양하게 떠오른 제조사는 한국의 ‘아이리버iRiver’였다. 내게 아이리버는 점점 낡아가는 아이팟에 대한 흥미로운 대안이 되었는데, 당시 내 눈을 사로잡았던 모델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그래서 선택한 기종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하지만, 다른 제품에 없는 음성 녹음 기능이 있었다. 휴대용 하드 드라이브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디자인 전공생에게는 편리한 점도 있었다. 돌이켜보면 내가 아이리버에 대해 매혹을 느꼈던 점은 그들의 기기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성공 신화였던 것 같다. 아이리버는 단순하게 유지하고 사용하기 쉽고 폐기하기 쉬운 MP3 플레이어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 애플처럼 아이튠즈를 통해 미디어 제국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준Zune’처럼 이상한 마케팅 전략을 시도하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소니처럼 독점 파일 형식에 집착하는 메모리 장치 기업의 오래된 전술에 얽매이지도 않았다. 한국의 IT 공룡인 삼성을 상대로 한 디자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도 했다. 그들은 대안적인 MP3 플레이어의 필요성을 알았고 이를 고수했다.
같은 시각 한국에서는 아이리버가 아이팟의 공세에 무너지고 망했지만, 해외의 상황은 자못 달랐다. 아이리버가 슬슬 곳곳에 퍼지자 미국에서 공부하던 내겐 애국심과 흥미가 동시에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이리버는 다른 회사들과는 달리 추가적인 걸 팔려고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애플은 아이튠즈 상품권을 주며 더 많은 MP3를 음원을 사라고 종용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준은 ‘준 음악 패스’라는 서비스를 론칭해 매달 돈을 내면 음악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지금의 스트리밍 플랫폼처럼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당시 점점 더 복잡해지는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속에서 해외 소비자들은 기능이 간단하고 디자인이 괜찮은 아이리버에 어떤 신선함을 느꼈던 것 같다.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면은 아이리버가 다른 사업으로 확장하지 않고 제품에만 집중한 게 결론적으로 실패의 원인이 됐다는 거다.
내가 MP3 플레이어를 바꾼 이유는 이후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벽으로 둘러싸인 애플 정원에 갇힌 듯한 느낌에 질려버려 안드로이드에 호기심을 보인 이유와 거의 같다. 점점 더 복잡해지고 부풀려지는 아이튠즈를 관리하는 게 지겨웠다. 다른 것을 손에 쥐고 싶었지만 결국 아이폰을 구입하자 아이팟으로 돌아왔다. 아이폰이란 검은 벽돌을 버리지 못하니 결국 지금은 가지고 있는 모든 기기가 검은 벽돌이다. 사실 나는 다른 장치에 대한 호기심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뒤늦게 구형 미디어 기기에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스마트폰이 야기한 피로감에서 비롯된 것 같다. 만약 우리가 쓰는 기술이 지금보다 더 세분화된다면 어떨까? 음, 스트리밍 음악 시대에 자신의 미디어를 관리하고 만드는 경험은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고 무척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편리함을 포기하고 노력을 택할 때, 리스너의 청취 경험은 보다 풍부해지고, 흥미로워지며, 창의적으로 바뀐다. 새로운 세기에 구세대의 유물인 카세트 플레이어와 MP3 플레이어를 탐색하려는 사람들에게 그런 발견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Now all these mixtapes are lost to time.
옛 추억과 기계를 회상하는 기회를 통해 내 음악적 감성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게 됐다. 지금은 진짜 편리한 세상이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음악 역사의 중요한 순간을 점하는 모든 곡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침대에서 잠옷 입은 상태로 레코드 디깅을 끊임없이 하는 게 가능한 시대라니. 친구들이랑 술집에서 신나게 놀다가 흥미로운 노래가 나오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음성 검색을 해서 어떤 곡인지 알아낼 수 있다. 무엇보다 골치 아픈 MP3 파일 관리에서 해방됐다.(물론 어딘가에 예전에 듣던 MP3 컬렉션을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수많은 편리함 속에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사실 나는 기기의 발전으로 인해 음악 경험이 여러 번 바뀌면서 많은 걸 잃어버렸다. 거의 15년 넘게 모은 MP3 컬렉션이 어느 날 외장하드 사고로 손상된 적도 있고,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경쟁하고 있을 때 내가 사용하던 서비스가 망하면서 내 음악 컬렉션이 하룻밤만에 사라져버리기도 했다. 이렇게 디지털은 쉽게 휘발되는 성질을 가진다. 손쉽게 접속이 가능하지만,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손실 외에도 더욱 가슴 아픈 아쉬움이 존재한다. 바로 음악적 감성과 창의성이다.
돌이켜 보면 나는 카세트 플레이어, MD, 그리고 MP3 플레이어의 녹음 기능을 통해 아주 좋은 훈련을 했다. 실시간으로 내 생각을 노현하며 음악 취향을 하나 하나 쌓아갈 수 있었다. 이런 말을 하면 진짜 꼰대스럽지만, 사실인 걸 어쩌나. 앞서 말했듯이 요즈음 디지털로 플레이 리스트를 구성하는 것과 실제로 믹스 테이프에 녹음하며 실물의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행위다. 이런 상호 작용은 음악과 또 다른 관계를 맺도록 돕는다. 나는 요즘 음악이 무의식적인 배경 음악, 즉 화이트 노이즈처럼 하나의 디지털 액세서리가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한다. 모든 게 편리한 스마트폰 안으로 흡수되면서 많은 창조물이 희생당하기도 했다. 요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음원 제작 앱들이 개발됐지만, 작곡과 믹스 테이프 문화는 매우 다르다. 녹음과 멈춤 버튼 두 개만 가지고 나만의 사운드 세계를 만들 기회가 사라지면서 내게 남은 것은 옛 추억들밖에 없다. 그나마 남아 있던 테이프도 여러 번 장거리 이사를 하면서 모두 사라져 버렸기에… 결국 어떤 기기도 영원한 건 없다.
Writer
제임스 채는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는 교포 디자이너이다. 디자인 작업을 하면서 교육자로 활동하고 있다. 홍익대학교 디자인컨버전스전공 조교수로 있으며 상업과 예술 사이에 디자인과 디자이너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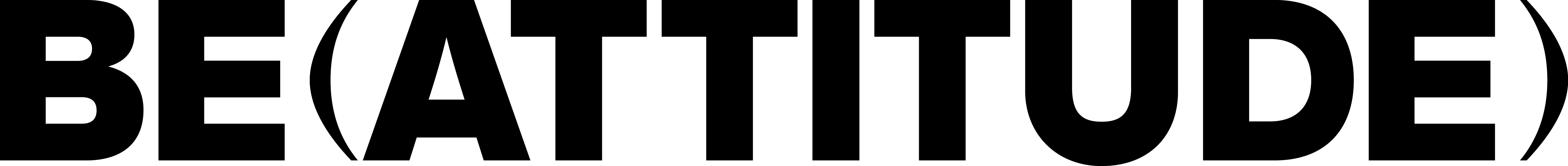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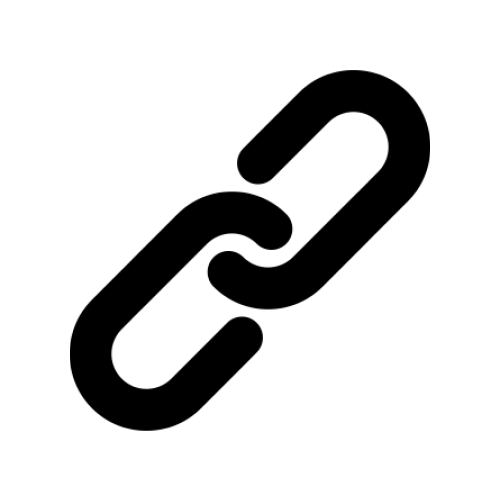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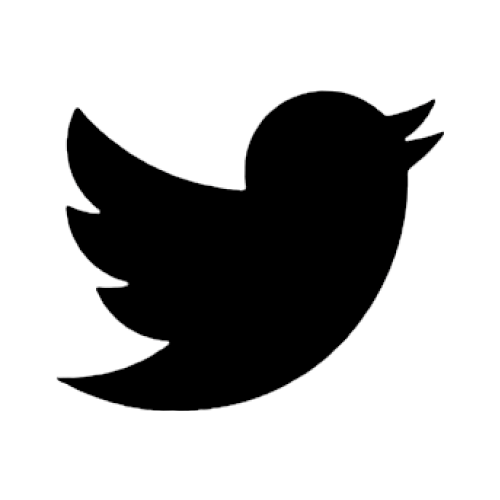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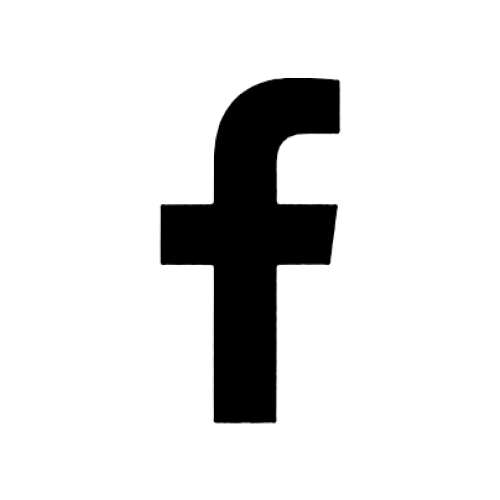
![[BA]산인류_삼네일](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06/BA산인류_삼네일-scaled.jpg)
![[BA]섬네일_유령서점](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04/BA섬네일_유령서점-scaled.jpg)




![[VP]진민욱_52_섬네일_크롭](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07/VP진민욱_52_섬네일_크롭-394x600.jpg)
![[BA]이병재 섬네일](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06/BA이병재-섬네일-1-400x600.jpg)
![[리뷰]스테이H](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06/리뷰스테이H-400x600.jpg)
![[BA]섬네일 박소진](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06/BA섬네일-박소진-394x60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