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say
이슈에 관한 다양한 오피니언을 엿봅니다
비애티튜드에 ‘편집으로 창작하기’를 연재하는 최혜진 작가의 네 번째 에세이가 도착했습니다! 최혜진 작가는 편집을 훈련이 필요한 고도의 정신 활동이라고 굳게 믿어요. 에디터는 정보 사이의 거리와 관계를 다각도로 파악하고 일련의 순서를 부여해 매력적인 스토리 혹은 메시지로 빚어내죠. 그중 유사성을 알아차리고 연결하는 능력인 유추의 경우, 친숙함에서 새로움으로 도약하는 강력한 도구로 에디터적 사고력의 기본이라고 해요. 유추력과 관련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에세이에서 확인해보세요.
“오래된 요소들을 가지고 새로운 조합을 만드는 능력은 관계를 알아보는 능력에 크게 의존한다.”
– 제임스 영 웹, 『아이디어 생산법』 중
이번 글은 가벼운 놀이로 문을 열어보려 한다. 아래,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장 구조를 가져왔다. 당신이라면 괄호에 어떤 말을 넣겠는가?
영국에 비틀스가 있다면, 한국에는 ( )가 있다.
‹슬램덩크›에 안 선생님이 있다면, ‹달려라 하니›에는 ( )가 있다.
뉴턴에게 사과가 있다면, 다윈에겐 ( )가 있다.
답을 찾는 데 집중해서 인식을 못 했을 수도 있지만, 당신의 뇌는 조금 전 A(영국, 슬램덩크, 뉴턴)에게 B(비틀스, 안 선생님, 사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내렸다. A와 B의 관계를 파악해야만 새로 제시한 C와 D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에 있어 비틀스의 의미를 ‘국가를 대표하는 음악 산업의 아이콘’으로 정의한다고 가정하면 어떨까? ‘한국에는 ( )가 있다’라는 문장에는 누가 어울릴까? 만약 ‘시공을 초월해 예술성을 인정받는 아티스트’로 정의한다면? 그때는 괄호에 누구를 넣어야 할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정보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이후에 덧붙일 수 있는 이야기의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편집 방향이 생긴다는 뜻이다.
창작에 있어 관계를 알아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회자되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뛰어난 시인이 지닌 창조성의 근원을 메타포metaphor, 즉 ‘은유’로 보았다. 언뜻 관계없어 보이는 두 대상의 연결고리를 알아보고 가시화하는 능력이 곧 창의성이라는 의미다. 황현산 선생의 책 『밤이 선생이다』를 예로 들어보자. ‘밤’과 ‘선생’은 언뜻 거리가 먼 단어이지만, ‘밤’이 가진 속성과 ‘선생’이 가진 속성에서 닮은 점을 찾아내 둘을 연결했다. 이렇게 은유는 유사성의 토양에서 싹을 틔운다.
그런데 갑자기 문학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은유나 유사성이 편집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편집은 기존에 존재하는 재료를 분류하고 조합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에디터는 정보 사이의 거리와 관계를 다각도로 파악하고 일련의 순서를 부여해 매력적인 스토리 혹은 메시지로 빚어낸다. 유사성을 알아차리고 연결하는 능력은 에디터적 사고력의 기본이다.
IBM의 프로덕트 디자이너 베티 퀸Betty Quinn이 인스타그램에서 진행하는 사이드 프로젝트 ‘Art History Fashion’ 사례를 보자. 디자인과 미술사를 전공한 그는 2017년부터 미술 작품과 패션 사진을 매칭하는 게시물을 올린다. 특정 미술 작품의 오마주 디자인만 올리는 게 아니다. 우연히 발견한 시각적인 연결고리를 차곡차곡 아카이브하면서 미술사적 기록이 동시대 시각 문화 전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이를 암묵적으로 설득한다. 구글, 콘데나스트, 파페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등과 협업한 해당 프로젝트의 재료는 보다시피 모두 오래된 이미지다. 시각 문화사의 창고에 쌓여있던 재료가 퀸의 편집을 거쳐 동시대 문화계의 의미망에서 새로운 지위를 얻었다. 유사성을 알아차리고 연결하는 편집의 가치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 www.instagram.com/arthistoryfashion

(왼쪽) 프리다 칼로, ‹The Broken Column›, 1944
(오른쪽) Jean Paul Gaultier’s ready-to-wear collection, from the Condé Nast Archive, 1998 © www.instagram.com/arthistoryfashion

(왼쪽) 프리다 칼로, ‹The Broken Column›, 1944
(오른쪽) Jean Paul Gaultier’s ready-to-wear collection, from the Condé Nast Archive, 1998 © www.instagram.com/arthistoryfashion
(왼쪽) 찰스 로버트 레슬리, ‹Queen Victoria in Her Coronation Robes›, 1838
(오른쪽) Rihanna in Guo Pei, Met Gala, 2015 © www.instagram.com/arthistoryfashion
Art History Fashion 계정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인다. “어떻게 그 많은 데이터에서 꼭 닮은 둘을 찾아냈을까?” 감탄의 이유를 정확히 특정하자면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찾아낸 성실성’에 있다. 두 이미지 사이의 유사성은 이미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어 알아차리기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숨어 있던 구조적 유사성을 파악하고 새롭게 재해석한 창작 앞에선 이런 감탄사가 터진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감탄의 이유는 발상의 독창성에 있다. 예를 들어 기원전 1세기경 로마에서 활동한 건축가 비트루비우스는 특별한 음향 장비 없이 멀리까지 소리를 전달하는 원형 극장을 설계했다. 강에서 퍼져나가는 물결을 보고, 공기로 퍼지는 소리 역시 물결 모양의 파동(주파수)일 것이라는 유추가 그 비결이었다. 너울거리는 물의 움직임에서 굴절과 간섭 등의 원리를 파악한 뒤 이를 소리에 적용해 잔향과 공명이 잘 일어나는 무대 공간을 설계한 것이다.
물 – 멀리 퍼져나간다 – 물결
소리 – 멀리 퍼져나간다 – 음파
비트루비우스는 직관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발견했다. 그로부터 1500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이 흐른 뒤에야 측정 기술이 생기고 음파 이론이 정립되기 시작한 걸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다. 그는 후대 물리학자에게 파동(wave)이라는 이해의 도구를 선물한 셈인데, 이는 전파, 광파, 중력파를 연구하는 현대 과학에 여전히 유효하다.
또 한 번 의문이 들 것이다. 갑자기 과학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편집과 무슨 상관이람? 비트루비우스의 사례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유추력이다. 유추는 문학가나 과학자에게만 필요한 사고력이 아니다. A의 구조를 빌려서 유사한 B에 적용하는 능력은 기존의 정보를 새롭게 조합하는 모든 이에게 유의미하다. 친숙함에서 새로움으로 도약하는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IMAGE DESCRIPTION IMAGE DESCRIPTION IMAGE DESCRIPTION IMAGE DESCRIPTION IMAGE DESCRIPTION⊕⊕

IMAGE DESCRIPTION IMAGE DESCRIPTION IMAGE DESCRIPTION IMAGE DESCRIPTION IMAGE DESCRIPTION⊕⊕

백정기, ‹자연사박물관›, 2019 © 최혜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그리드 아일랜드»에서 만난 백정기 작가의 ‹자연사박물관›은 어마어마한 물성이 인상 깊게 다가온 작품이다. 물이 담긴 수백 개의 유리병과 유리잔이 선반에 차곡차곡 놓여 있는데, 각 선반은 유대류, 소목류 등 하나의 생물 분류 체계를 상징한다. 선반을 채운 유리병 앞에는 녹색반지고리주머니쥐, 흰꼬리사슴, 난쟁이멧돼지, 살찐꼬리가짜엔테치누스 등 실존하는 동물의 학명과 생태에 관한 설명이 적혀 있다. 자연사박물관에서 만날 법한 글을 미술관의 설치 작품에 적용한 경우다.
이 작품에서 배울 수 있는 에디터적 사고력은 무엇일까? 백정기 작가는 동물(생명체)과 유리병이라는 멀리 떨어진 두 대상 사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구조를 찾았다. 몸에 물을 지니고 산다는 점이다. 지구에 처음 물이 생성된 후 수억 년 동안 물의 전체 양은 줄거나 늘지 않았다. 우리 인간의 체액이 모두 한때 다른 생물의 체액이기도 했다는 의미다. 백정기 작가는 이런 관점을 작품으로 시각화하기 위해 다양한 생김새를 지닌 유리병을 재료로 사용했다.
‹유추를 이용한 발상›
동물 – 물(체액)을 몸에 지닌다 – 다양한 생김새
유리병 – 물을 몸에 지닌다 – 다양한 생김새
‹작가가 부여한 메시지/의미›
1) 물 자체는 형태가 없고, 컨테이너 형태에 따라 일시적인 모양으로 살아간다.
2) 인간, 동물, 미물도 결국 하나의 물을 공유한다. 고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현대미술이 익숙하지 않은 독자는 이런 식의 사유를 얼핏 어렵게 느낄 수 있다. 하지만 A에서 발견한 내용을 B에 적용해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인식을 만드는 작업은 우리 모두가 매일 밥 먹듯 한다. ‘걸어 다니는 백과사전’이라는 별명을 가진 물리학자이자 인지과학자 더글러스 호프스태터의 책 『사고의 본질』에서 말하듯, “유추는 특이한 사고의 한 유형이 아니라 인지 활동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조금 더 쉽고 친숙한 예를 보자. 아마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자전거계의 롤스로이스
막걸이계의 돔 페리뇽
두부계의 에르메스
카메라계의 롤렉스
강사계의 김태희
트로트계의 비욘세…
이런 리스트는 왜 끝없이 탄생하는 걸까? 그냥 말장난 아니냐고? 누가 저런 식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냐고? 정말 그럴까? 아무런 주목 효과나 설득력이나 각인 효과가 없는데도 사람들이 저런 도식을 만들며 소통하는 걸까? 아래 도표를 보자.

@ https://www.buzzfeed.com/michellerial/is-your-startup-idea-already-taken
이 도표는 버즈피드 뉴스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미셸 리알이 만든 것으로, 몇 해 전 실리콘밸리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Is Your Startup Idea Already Taken?’이다. X축은 스타트업의 대표적 사업 모델을 상징하는 4개 기업이 자리한다. 우버, 틴더, 버치박스, 에어비앤비. 사업 모델로 표기하면 모빌리티 O2O 모델, 소셜 디스커버리 모델, 구독 경제 모델, 공유 플랫폼 모델 정도일 테다.
Y축에는 온갖 산업군이 있다. 첫 행에 등장하는 반려견 산업을 보면 우버 모델은 WAG!, 틴더 모델은 BARKBUDDY, 버치박스 모델은 BARKBOX, 에어비앤비 모델은 DOGVACAY 서비스가 이미 차지했다. 빈 땅이 없다. 반면 캠핑 산업을 보면 에어비앤비 모델만 선점했고, 나머지 땅은 모두 비었다. 캠핑계의 우버, 캠핑계의 틴더, 캠핑계의 버치박스를 만들 가능성이 살아있다는 뜻이다. (모두 알다시피 A의 성공 사례를 모델로 삼아 B에 적용하는 일은 경영계의 오랜 전략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A에서 발견한 내용을 B에 적용함으로써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인식을 만드는 작업을 우리는 밥 먹듯 한다. 블로그 포스팅에 단골로 등장하는 카피부터 우아한 미술관 전시 작품, 수억 원의 투자금이 걸린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이르기까지, 유추를 지렛대 삼아 도약하는 아이디어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이즈음 되면 이런 질문이 들 것이다. 새로운 조합을 만드는 능력이 ‘관계를 알아보는 능력’에 크게 의존한다면, 도대체 관계를 알아보는 능력은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내 경험으로는 작은 요령밖에 전하지 못하겠지만, 그간 에디터로서 어떤 연습을 했는지 이야기하며 글을 마치려 한다.
먼저 새로운 주제나 과업을 받으면 여기에서 연상할 수 있는 언어와 이미지 기억을 최대한 끌어내는 시간을 갖는다. 낙서도 좋고, 마인드맵도 좋다. 체계화를 해야 한다는 부담을 일단 내려놓고 아무 말이나 생각나는 대로 받아 적는다. 이때 도움이 되는 마법의 문장이 “OO란 무엇인가?”이다. (지난 연재 글을 참고하시길.) 가정문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다. “만약 OO가 사라지면? OO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OO에 무언가를 추가해서 새롭게 하면? OO를 반대말로 표현하면?” 등등.
‘편집으로 창작하기’ 연재를 기획할 때도 비슷했다. 잡지 에디터로 연마한 사고력과 현대미술을 연결하겠다는 아이디어가 처음부터 명확했던 건 아니다. ‘편집이 뭐지? 편집할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하지? 편집은 생산보다 열등한가? 에디터는 큐레이터, 프로듀서, DJ 같은 사람 아닌가? 그런데 요즘 편집하지 않는 사람도 있나?’ 등등 질문을 이어가며 생각나는 단어들을 나열해 보았다. 연상-그룹핑-연상-그룹핑을 반복하며 아래와 같은 생각의 얼개가 만들어졌다. 이윽고 번쩍! 유레카의 순간이 찾아왔다.

편집과 동시대 미술이 거의 같은 메커니즘으로 굴러가는 창작 행위라는 점을 발견한 것이다. A와 B 사이의 구조적 유사성을 지렛대 삼아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 순간. 바로 유추가 작동한 순간이었다.

이처럼 연상으로 쏟아낸 단어, 이미지, 아이디어, 질문 등을 소그룹으로 묶어서 집단화하다 보면 이를 지탱하는 상위 개념, 구조, 추상적 의미가 눈에 들어올 때가 있다. 단행본으로 치자면 제목과 목차, 미술 작품으로 치자면 키 메시지, 상품으로 치자면 핵심 편익, 기업으로 치자면 핵심 가치에 해당하는 알맹이를 발견한 셈이다.
나는 이런 알맹이를 손에 쥐어야 일말의 새로움을 품은 창작물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난잡하게 흩어진 재료를 일관된 계획에 따라 정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지점을 향해 달리면 흡인력 있는 무언가가 만들어진다. 이 알맹이는 인식의 프레임이 되어 다른 상황, 다른 필드, 다른 창작에 적용가능한 이해의 도구가 된다. 앞서 소개한 비트루비우스의 파동처럼 말이다.
혹시 어렵다고 느낀다면, 내 뜻이 아주 잘 통한 것 같다. 편집은 훈련이 필요한 고도의 정신 활동이다. 노트북 앞에 거북목을 하고 앉아 온종일 글씨와 이미지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머릿속에서 인식의 대륙을 근경과 원경에서 조망하며 온갖 가능성을 짓고 부수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에디터가 있다면 부디 따스하고 너그러운 시선으로 그들 눈가에 내려앉은 다크서클을 포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애당초 편집이 만만한 행위였다면 이 연재는 존재 가치가 없었을 테니 말이다.
Writer
최혜진(@writer.choihyejin)은 19년차 잡지 에디터다. «디렉토리»«1.5°C»«볼드저널» 편집장으로 일했고, 에디터십을 기반으로 기업의 브랜드 미디어 전략을 제시하는 일을 한다.『우리 각자의 미술관』 『북유럽 그림이 건네는 말』 등 일곱 권의 예술서를 썼다. 동료애 기반의 에디터 커뮤니티 Society of Editors(@society.editors)를 이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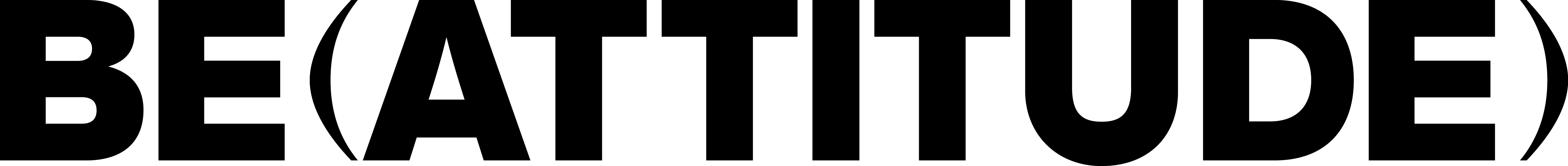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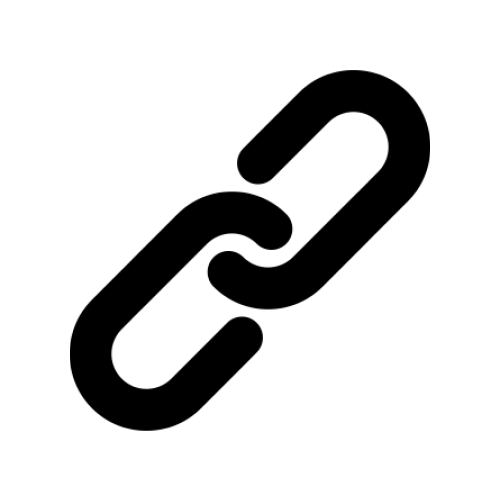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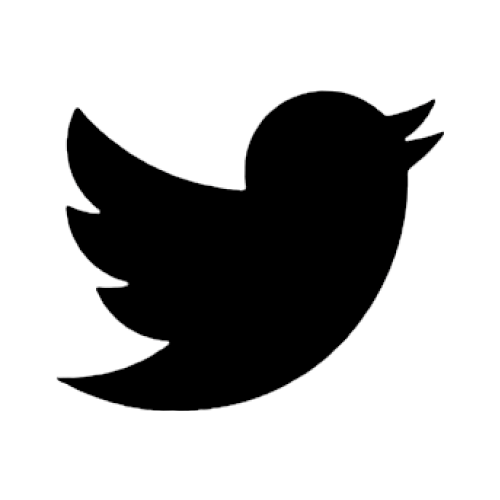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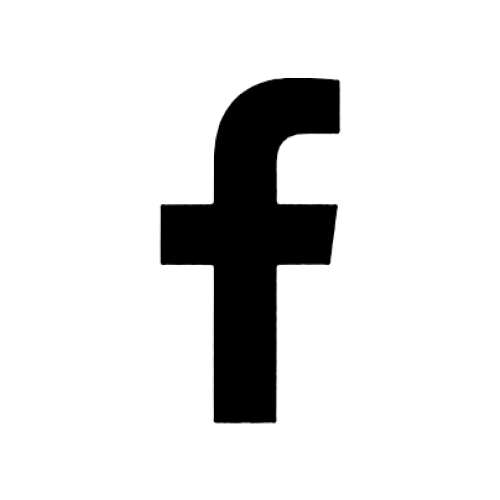




![[VP]진민욱_52_섬네일_크롭](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07/VP진민욱_52_섬네일_크롭.jpg)
![[BA]이병재 섬네일](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06/BA이병재-섬네일-1-scaled.jpg)
![[BA]섬네일 박소진](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06/BA섬네일-박소진.png)
![[BA]섬네일](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06/BA섬네일-scaled.jpg)
![[BA]이윤호_섬네일](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05/BA이윤호_섬네일.jpg)
![[BA]섬네일_최태훈](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05/BA섬네일_최태훈-scaled.jpg)
![[VP]진민욱_52_섬네일_크롭](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07/VP진민욱_52_섬네일_크롭-394x600.jpg)
![[BA]이병재 섬네일](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06/BA이병재-섬네일-1-400x600.jpg)
![[리뷰]스테이H](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06/리뷰스테이H-400x600.jpg)
![[BA]섬네일 박소진](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06/BA섬네일-박소진-394x60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