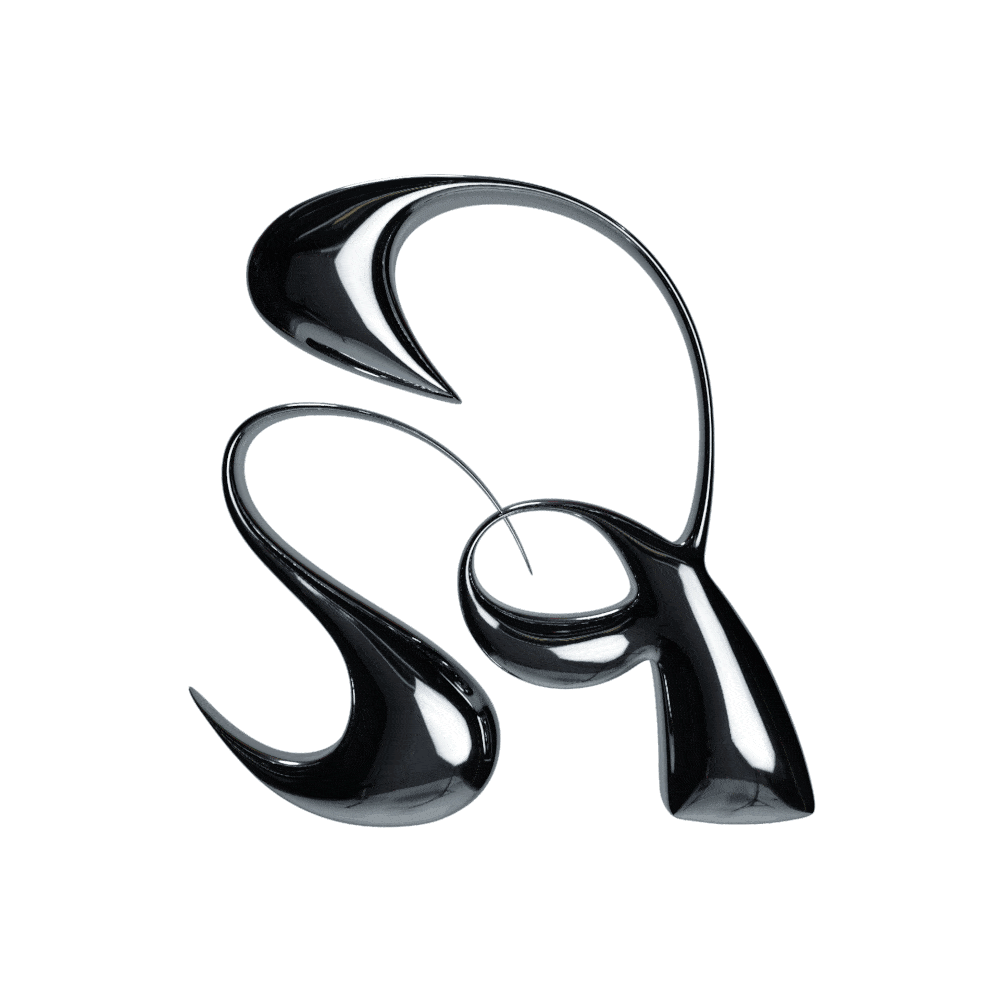![[VP]조재영_1](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04/VP%EC%A1%B0%EC%9E%AC%EC%98%81_1-scaled.jpg)
Visual Portfolio
아티스트의 흥미로운 작업을 파고듭니다
조재영 작가는 겉보기에 귀엽고, 친근하고, 갖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깜찍한 입체 작업을 해요. 기하학적인 구와 각의 형태가 만들어내는 조형적인 즐거움도 상당하죠. 그런데 알고 보면,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숨어 있습니다. 카드보드지로 만든 작업은 인간의 신체를 형상화했는데요. 종이라는 소재가 지닌 변질과 변형의 굴레를 따라 이질적이고 비가시적인 힘을 구현한 결과물에 음과 양, 안과 밖, 나와 너를 넘어 생명의 죽음과 탄생, 우주의 법칙까지 담겨있답니다. ‘지금 여기라는 구체적 시공간에서 자신의 몸을 어떻게 구성해 낼 것인가?’ 늘 질문을 던지는 그는 작업을 통해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까지 사고하며 범우주적인 관계 맺기를 상상합니다. “그냥 하고, 일단 하는” 훈련을 통해 선명한 명제를 손에 쥐고, 낯선 감각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조재영 작가의 이야기를 BE(ATTITUDE) 웹 아티클에서 살펴보세요.
![[VP]조재영_2](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04/VP%EC%A1%B0%EC%9E%AC%EC%98%81_2.jpg)
‹Body & Bodies›, 2022, Cardboard, contact paper, metal frame, paint, 250 × 300 × 230 cm, «각», 하이트컬렉션, 2022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입체와 설치 작업을 하는 조재영입니다.
지금의 창작자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어릴 적 언제부터인가 그림 그리는 게 재미있었어요. 서양화 전공으로 대학에 입학했는데 학부제로 운영해서 다른 전공도 경험해 볼 수 있었죠. 손으로 여러 물질과 물체를 만질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 조소를 전공으로 선택했고, 지금까지 입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공간을 편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마침, 요새 작업실 이사를 준비 중이에요. 지금 사용하는 작업실은 한쪽 벽면에 책장이, 다른 벽면에는 재료로 채운 선반이 있어요. 진행 중인 작업을 올려놓은 선반과 완성작을 보관하는 선반은 작업실 안쪽에 존재하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테이블과 재료를 다루며 작품을 제작하는 테이블은 분리되어 있답니다. 앞으로 옮기게 될 공간은 어떻게 변할지 잘 모르겠네요. 아마 내부 구조는 비슷할 듯해요. 새로운 작업실 주위는 매우 조용한 편이고, 산책할 장소가 많아 보여서 기대됩니다.
작가님은 영감을 주로 어디서 얻으시나요?
지인과의 대화에서, 혹은 책을 읽으며 영감을 얻곤 해요. 함께 공부하고 대화를 나누는 지인들이 있는데요. 근래 떠오른 생각을 주제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건넨 것들이 증폭되어 제게 다시 돌아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책 읽는 것도 비슷해요. 제가 지닌 생각의 한계를 깨트려주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이전에 하던 생각이 전복되는 지점에서 새로운 질문이나 아이디어가 생기곤 해요.
![[VP]조재영_3](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04/VP%EC%A1%B0%EC%9E%AC%EC%98%81_3-scaled.jpg)
‹Body Module›, 2024, Cardboard, contact paper, metal, paint, chain, beads, Dimensions variable, «SEE-SAW», FIM, 2024
![[VP]조재영_4](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04/VP%EC%A1%B0%EC%9E%AC%EC%98%81_4-scaled.jpg)
‹Body Module›, 2024, Cardboard, contact paper, metal, and paint, 27 × 30 × 110 cm, «Body & Bodies», Carvalho Park, 미국 뉴욕, 2024
말로 설명하기 어렵겠지만, 작업하실 때 어떤 창작 과정을 거치시나요?
평소 메모를 많이 해요. 대화 중에도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단어들을 적어두고, 책을 읽거나 길을 걷다가도 생각나는 것들을 메모 형태로 많이 기록합니다. 작품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를 때면 그게 어디든 일단 드로잉으로 남겨둡니다. 시간이 지나고 여기에 또 다른 이미지를 덧붙일 때는 다른 색으로 표시해 두죠. 옆에다 새로 그려 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면 일단 책상에 앉아서 뭐든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조금씩 감을 잡아가는데요. 아니다 싶을 때는 재료나 제작 방식을 바꿔보고, 확신이 들면 속도를 더 내는 식이에요. 해놓고 보면서 중간중간 덧붙이거나 아이디어를 수정한 부분은 드로잉으로 남겨둡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작업할 때 반영해요. 글 쓰고 드로잉하고 작업하는 과정이 조화롭게 순환하다 보면, 점차 작업을 마무리할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상상하며 작업을 시작하지만, 그 디테일은 실제 만드는 과정에서 잡아갑니다. 작업 도중에 의도와는 다르게 또 새로 발견하는 것들이 반가워요. 초반 아이디어에서 최종 결과물 사이의 우연한 만남을 즐기면서, 이들과 대화하듯 작업하는 걸 좋아합니다.
![[VP]조재영_5](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04/VP%EC%A1%B0%EC%9E%AC%EC%98%81_5-scaled.jpg)
‹Body Module›, 2024, Cardboard, contact paper, metal, paint, wood, and chain, 32 × 30 × 127 cm, «Body & Bodies», Carvalho Park, 미국 뉴욕, 2024
최근 작업이 궁금합니다. 몇 가지 작품을 예로 들어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간 작업을 통해 실체, 주체 중심의 인식 방식을 해체하는 몇몇 시도들을 해왔어요. 최근 인류학을 공부하며 신화, 비인간, 여성, 몸 등을 키워드로 연구 범위를 넓히고 있지요. 인간이 우주 자연의 일부로 다른 생명과 공존해 온 삶의 방식을 익혀가며, 이로부터 자연스레 영감받아 ‹Twin Balls›(2024), ‹Twin Birds›(2024), ‹Twin Organs›(2024), ‹Twin Garden›(2024) 등의 작업을 근래에 진행했습니다.
![[VP]조재영_6](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04/VP%EC%A1%B0%EC%9E%AC%EC%98%81_6-scaled.jpg)
‹Twin Balls›, 2024, Cardboard, contact paper, chain, beads, 45 × 73 × 19 cm, «Body & Bodies», Carvalho Park, 미국 뉴욕, 2024
![[VP]조재영_7](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04/VP%EC%A1%B0%EC%9E%AC%EC%98%81_7-scaled.jpg)
‹Twin Balls›, 2024, Cardboard, contact paper, chain, beads, 42 × 74 × 30 cm, «Body & Bodies», Carvalho Park, 미국 뉴욕, 2024
![[VP]조재영_8](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04/VP%EC%A1%B0%EC%9E%AC%EC%98%81_8-scaled.jpg)
‹Twin Balls›, 2024, Cardboard, contact paper, chain, beads, 42 × 74 × 30 cm, «Body & Bodies», Carvalho Park, 미국 뉴욕, 2024
‹Twin Balls›, 2024, Cardboard, contact paper, chain, beads, 42 × 32 × 83 cm, «Body & Bodies», Carvalho Park, 미국 뉴욕, 2024
이들 작품 모두 종이라는 재료를 껍질로 삼아 이를 통해 신체 부분을 형상화했어요. 그런데 종이가 지닌 물성 탓에 습기로 인해 처지거나 어딘가에 부딪혀 부서지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겪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변질, 변형된 구조를 잘라내고, 그 위에 새로운 구조를 덧붙이는 과정을 반복해요. 반복할수록 신체 구조는 더 세밀하게 쪼개지며 처음의 형태에서 점차 멀어지고, 각 변형의 마디마다 직전의 형태와 다른 여러 가지 차이점을 만들어 냅니다. 해당 조각은 다른 조각과 접합되었다가 해체되는 운동을 통해 관계를 맺어 가는데요. 이 과정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조각을 구성하는 기하학적 형태가 서로를 복제하기도 하고, 그 사이로 구(球, sphere)와 각(角, horn)이라는 형태가 틈틈이 개입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VP]조재영_9](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04/VP%EC%A1%B0%EC%9E%AC%EC%98%81_9.jpg)
‹Twin Birds›, 2024, Cardboard, contact paper, metal frame, clay, chain, 100 × 50 × 175 cm, «작은 리듬이 있는 공간», 누크갤러리, 2024
저는 마치 쌍둥이가 그렇듯, 완전한 동질(同質)에서 출발해 다른 성질로 분리된 존재나 힘을 상상하며 이 변형 운동에 동참시킵니다. ‘하나의 몸에서 탄생한 이질적이고 비가시적 힘이 형태를 갖는다면 어떤 모습일까?’ 제 작업에서는 앞서 말한 ‘구’와 ‘각’의 형태로 그 두 힘을 가시화해 최소 단위로 만들었죠. 구는 기운을 낳고 담아 기르는 힘이라면, 각은 꽉 찬 구를 터뜨리며 과하게 축적하거나 응고하는 걸 막는 힘처럼 다가왔어요. 차면 깨고, 다시 채우고 버리는 상반된 힘의 교류, 순환을 가시화하는 거죠. 동질적인 것의 결합은 질적 변화 없이 양적 증가만을 가져와요, 음과 양, 위와 아래, 안과 밖, 나와 너 등 서로 다른 성질, 힘이나 상태가 서로를 향해 얽혀 들어갈 때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VP]조재영_10](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04/VP%EC%A1%B0%EC%9E%AC%EC%98%81_10-scaled.jpg)
‹Twin Organs›, 2024, Cardboard, contact paper, candle, chain, Dimensions variable, «작은 리듬이 있는 공간», 누크갤러리, 2024
이런 과정을 거쳐 종이 조각은 새로운 기관(organ)이자 몸체로 독특한 형상을 갖추어 갑니다. 서로 연결되면서도 자신만의 신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지금 여기서 실존하겠다는 과제를 수행해 냅니다. 해체, 접합으로 변형을 거친 신체 조각은 기존 인간의 신체, 그 전체 형상에 종속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사물, 비인간의 어느 부분과 연결되어 그 형상이 더욱 낯설어집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와 변형을 거치는 조각들은 그렇게 인간을 관통해 비인간의 몸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저는 중단 없이 활동하는 이 변형 과정이 곧 생명의 죽음과 탄생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탄생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죽음은 탄생을 전제로 하잖아요. 제 새로운 몸은 타자의 몸의 죽음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우주가 순환하는 모습이자, 우주가 존재를 탄생시키는 모습이라고 여겨져요. ‹Twin Garden›의 원형 공간은 이처럼 순환하는 우주 공간을 형상화한 결과물이기도 해요. 더불어 새 생명을 품고 변화의 과정을 수용하며 낳아 기른다는 점, 고정된 하나의 실체를 고집하지 않고 타자와 관계 맺으며 스스로를 변형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몸과 닮았다는 생각도 합니다.
![[VP]조재영_11](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04/VP%EC%A1%B0%EC%9E%AC%EC%98%81_11-scaled.jpg)
‹Twin Garden›, 2024, Cardboard, contact paper, metal frame, fabric, chain, acrylic, 320 × 320 × 230 cm, «제24회 송은미술대상전», 송은, 2024
![[VP]조재영_12](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04/VP%EC%A1%B0%EC%9E%AC%EC%98%81_12.jpg)
![[VP]조재영_13](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04/VP%EC%A1%B0%EC%9E%AC%EC%98%81_13.jpg)
‹Twin Garden›, 2024, Cardboard, contact paper, metal frame, fabric, chain, acrylic, 320 × 320 × 230 cm, «제24회 송은미술대상전», 송은, 2024
최근 작가님이 작업을 통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지금 여기라는 구체적 시공간에서 나의 몸을 어떻게 구성해 낼 것인가?’라는 질문을 늘 던지고 있어요. 이에 대한 전제는 몸은 계속 변한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독립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타자와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결국 물질로 몸체를 만드는 일, 타자와 구별되는 자신만의 몸체를 구성하는 일에는 본인의 엄청난 수행력이 필요하답니다. 더불어 ‘타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라는 질문을 연이어 해요. 예전에는 한동안 인간으로 타자의 범위를 한정했던 것 같아요. 근래에는 동식물, 해, 달, 바다, 보이지 않는 영혼까지 그 범위를 넓혀서 관계 맺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돼요. 몸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형태이자, 그것을 담는 그릇이자, 그것이 변화하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기운과 형태, 타자와 나 등이 경계가 없는 듯 연결되고 소통하면서, 또 어떨 때는 경계를 지어 내는 운동이 재미있고, 그 경계가 지닌 긴장에 집중하게 돼요.
![[VP]조재영_14](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04/VP%EC%A1%B0%EC%9E%AC%EC%98%81_14-scaled.jpg)
‹Body & Bodies›, 2024, Cardboard, contact paper, metal, paint, wood, chain, Dimensions variable, «Body & Bodies», Carvalho Park, 미국 뉴욕, 2024
![[VP]조재영_15](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04/VP%EC%A1%B0%EC%9E%AC%EC%98%81_15-scaled.jpg)
‹Body & Bodies›, 2024, Cardboard, contact paper, metal, paint, wood, chain, Dimensions variable, «Body & Bodies», Carvalho Park, 미국 뉴욕, 2024
![[VP]조재영_16](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04/VP%EC%A1%B0%EC%9E%AC%EC%98%81_16.jpg)
‹Body & Bodies›, 2024, Cardboard, contact paper, metal, paint, wood, chain, Dimensions variable, «Body & Bodies», Carvalho Park, 미국 뉴욕, 2024
최근 작업을 진행하며 만족스러운 부분과 아쉬운 부분이 궁금합니다.
요즘 작업은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있어서, 저도 이런저런 실험을 하면서 재미있게 진행했어요. 그래서인지 대체로 만족스러웠답니다. 다만 새로운 재료나 매체를 더 다뤄보고 싶었는데, 일부는 실천했고 일부는 아쉬운 상태로 남아있어요. 다음 작업에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평소 일상을 보내는 방식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일은 많은 편이지만, 일과는 단순해요. 외부 미팅이 없으면, 보통 아침에는 명상과 함께 간단히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작업실로 이동해 저녁 늦게까지 있는 편이에요. 작업실에 도착하면 스스로 ‘일지(日誌)’라고 부르는 노트에 근래 집중하는 생각을 써요. 내용은 대부분 동일하지만, 매일 반복적으로 씁니다. 마치 처음인 듯 마음에 새기며 종이 위에 쓰다 보면, 같은 내용이라도 순서나 단어 등이 미세하게 차이가 생기는데요. 그 차이 덕분에 같은 내용이 다르게 느껴지더군요.
일지를 작성한 이후에는 연구하며 질문 중인 주제들을 몇 개로 세분화해서 글을 씁니다. 이때 이런저런 공상을 많이 해요. 도움 되는 책을 읽으며 필요한 자료를 찾기도 하죠. 글을 쓰거나 책을 읽다가 이미지들이 떠오를 때는 곧바로 드로잉으로 남깁니다. 오후가 되면 앞치마를 착용하고 작업대 앞에서 작업에 몰두합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올 때는 약 1시간 정도 도보로 이동합니다.
![[VP]조재영_17](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04/VP%EC%A1%B0%EC%9E%AC%EC%98%81_17.jpg)
‹Body & Bodies›, 2022, Cardboard, contact paper, metal frame, paint, 250 × 250 × 230 cm, «apmap 2022 seoul – apmap review», 아모레퍼시픽미술관, 2022
![[VP]조재영_18](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04/VP%EC%A1%B0%EC%9E%AC%EC%98%81_18.jpg)
‹Body & Bodies›, 2022, Cardboard, contact paper, metal frame, paint, 250 × 300 × 230 cm, «각», 하이트컬렉션, 2022
![[VP]조재영_19](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04/VP%EC%A1%B0%EC%9E%AC%EC%98%81_19.jpg)
‹Things from the White›, 2022, Wood, cardboard, contact paper, paint, Dimensions variable, «각», 하이트컬렉션, 2022
요즘 가장 큰 관심거리는 무엇인가요?
최근에는 주로 인류학과 관련한 책을 많이 읽고 있어요. 제게 익숙한 근대 사회가 아니라 소위 ‘원시’, ‘미개’, ‘야만’이라고 말하는 시대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세상에 대한 근대인의 해석과 판단이 얼마나 오만한 것인지 깨닫고 있어요. 고대 인류는 우주 전체, 다른 생명과 연결된 감각으로 살았더라고요. 자신을 우주와 분리하지도 않았고요. 반면, 지금 우리는 ‘자아’라는 왜소한 틀에 갇혀서 허덕이잖아요. ‘우주를 감각하며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자신에게 자주 질문하고 있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작업에는 어떻게 묻어나나요?
일상과 작업, 실행하는 일, 경험하는 사건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려는 의지가 제게 있어요. 소소한 경험에서 가치를 발견하면 그것이 작품이 되기도 하고, 작업 도중에 깨달은 것으로 일상의 습관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삶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살아요.
![[VP]조재영_20](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04/VP%EC%A1%B0%EC%9E%AC%EC%98%81_20-scaled.jpg)
‹Square Body›, 2024, Cardboard, contact paper, metal frame, wood object, chain, 100 × 130 × 30 cm, «작은 리듬이 있는 공간», 누크갤러리, 2024
슬럼프가 올 때는 어떻게 극복하세요?
슬럼프를 크게 의식하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리듬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집중이 잘 되는 날과 정신이 분산되는 날이 있거든요. 마음이 산란할 때는 많이 걸으려고 노력합니다.
최근 들어 찾아온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인가요?
앞서 작업실 얘기를 잠시 했는데요. 입체 작업을 만들고 설치작이 크다 보니, 작품 제작이나 보관과 관련한 작업실 문제가 가장 크답니다.
작가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창작자의 태도와 철학을 알려주시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충실하다’라는 게 대체 뭘까, 저도 계속 고민 중인데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어떻게 변해가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등 제 의식 속의 미세한 지점을 알아채고, 이를 직면하려고 노력합니다.
![[VP]조재영_21](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04/VP%EC%A1%B0%EC%9E%AC%EC%98%81_21.png)
‹Alice’s Room›, 2024, Wood, cardboard, contact paper, paint, Dimensions variable, «추상과 관객», 경남도립미술관, 2024
![[VP]조재영_22](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04/VP%EC%A1%B0%EC%9E%AC%EC%98%81_22-scaled.jpg)
‹Alice’s Room›, 2024, Wood, cardboard, contact paper, paint, Dimensions variable, «SEE-SAW», FIM, 2024
좋아하는 것을 지속하려는 다른 창작자에게 건네고 싶은 노하우나 팁을 공유해 주신다면요?
글쎄요… 어떤 면에 있어서, 저는 생각을 단순하게 하려고 해요. 스스로에게 선명한 명제를 쥐여준달까요. 그리고 몸을 움직여 ‘그냥 하고, 일단 하는’ 훈련을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지루하다는 감정이 느껴질 때가 온다면, 그때 조심하려고 해요. 새로움을 느끼고, 낯선 감각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고 싶습니다. 함께 질문하며 대화할 수 있는 친구, 다양한 관점을 서술하는 책 읽기가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현재 품고 있는 이상적인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할머니가 되어서도 어제와 다름없이 작업실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VP]조재영_23](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04/VP%EC%A1%B0%EC%9E%AC%EC%98%81_23.jpg)
Artist
조재영(@jaiyoungcho)은 인식 방식에 대한 관심에서 작업을 출발한다. 각기 다른 인식 방식이 각자의 현실을 만들기에, ‘무엇을 인식할 것인가?’에 앞서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선행된다. 그는 자신이 경험하는 사건, 현상 등을 통해 기존 인식 방식이 작동하는 과정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것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 관찰하고 실험한다. 최근 신화, 비인간, 여성, 몸 등을 키워드 삼아 연구 범위를 넓히며 기존의 인식 체계로 포획하지 못하던 중간자적 존재를 신체에 빗대어 상상하는 중이다. «Body & Bodies»(Carvalho Park, 미국 뉴욕, 2024), «Cross Reaction»(Krognoshuset, 스웨덴 룬드, 2021), «바디그라운드Body Ground»(온수공간, 서울, 2020), «DON’T KNOW»(금호미술관, 서울, 2016)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제24회 송은미술대상전»(송은, 2024), «apmap 2022 seoul – apmap review»(아모레퍼시픽미술관, 2022), «각»(하이트컬렉션, 2022), «다른 곳»(아뜰리에 에르메스, 2020) 등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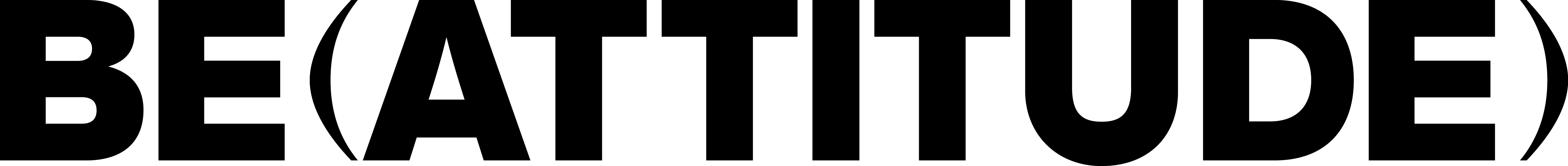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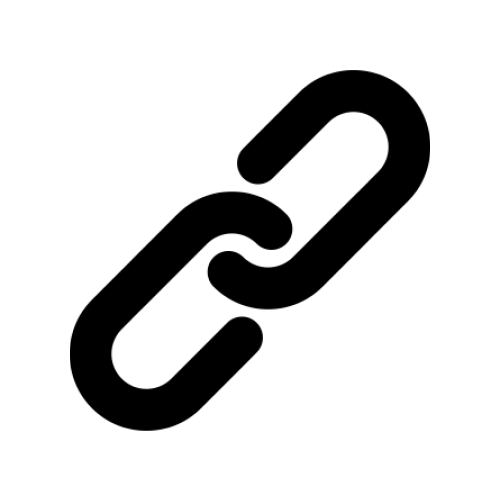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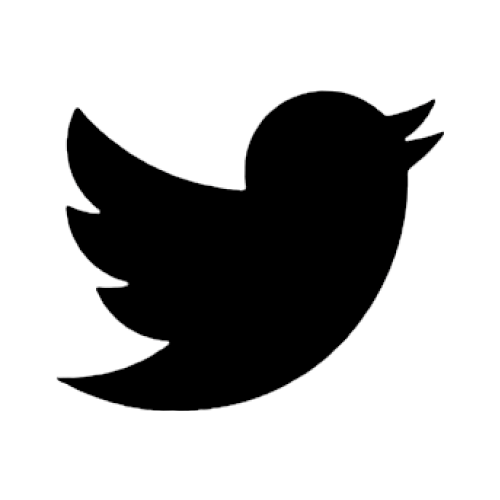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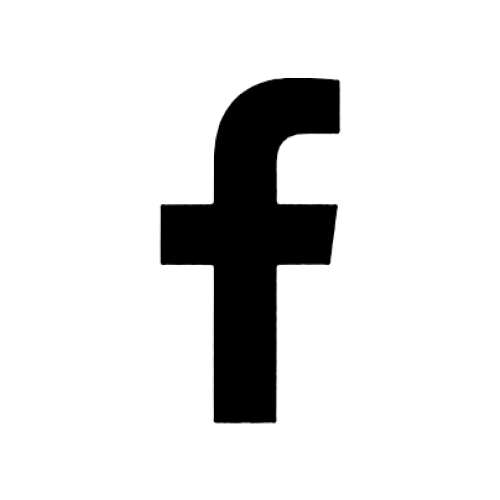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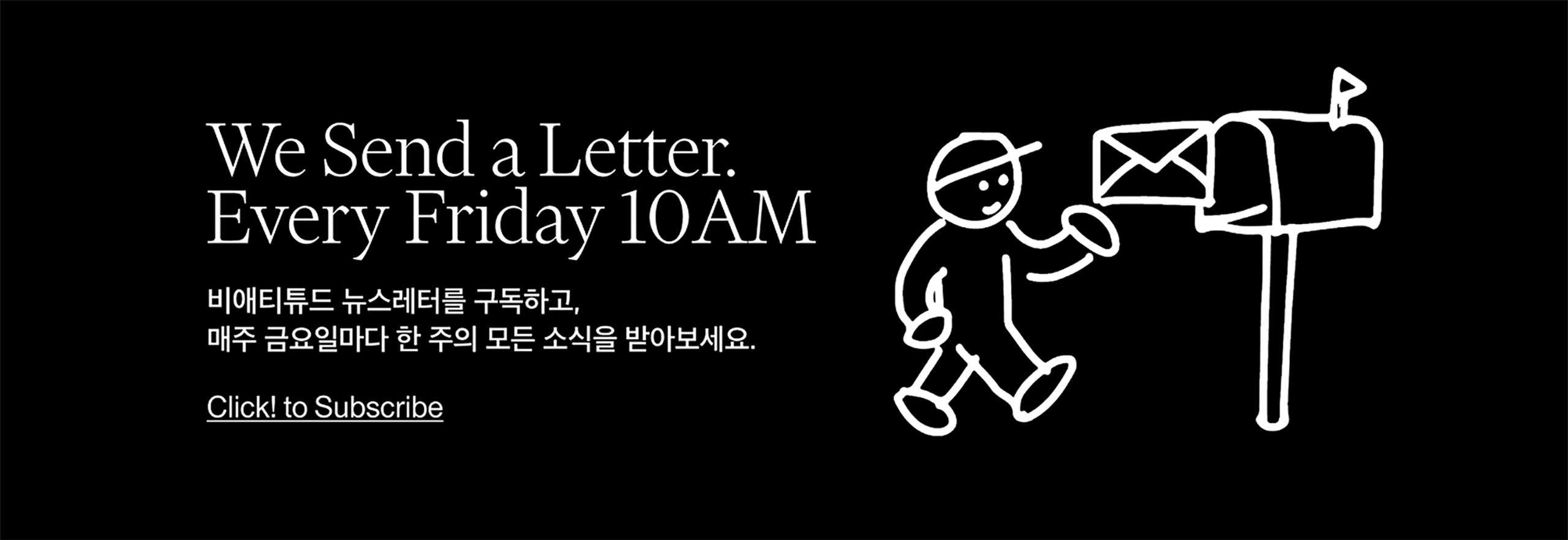
![[BA]섬네일](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12/BA%EC%84%AC%EB%84%A4%EC%9D%BC-8-scaled.jpg)
![[BA]섬네일](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12/BA%EC%84%AC%EB%84%A4%EC%9D%BC-6-scaled.jpg)

![[BA]섬네일](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12/BA%EC%84%AC%EB%84%A4%EC%9D%BC-4-scaled.jpg)
![[BA]섬네일](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12/BA%EC%84%AC%EB%84%A4%EC%9D%BC-3-scaled.jpg)
![[BA]섬네일](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12/BA%EC%84%AC%EB%84%A4%EC%9D%BC-2-scaled.jpg)
![[BA]섬네일](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12/BA섬네일-7-400x600.jpg)
![[BA]섬네일](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12/BA섬네일-8-400x600.jpg)
![[BA]섬네일](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12/BA섬네일-6-400x6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