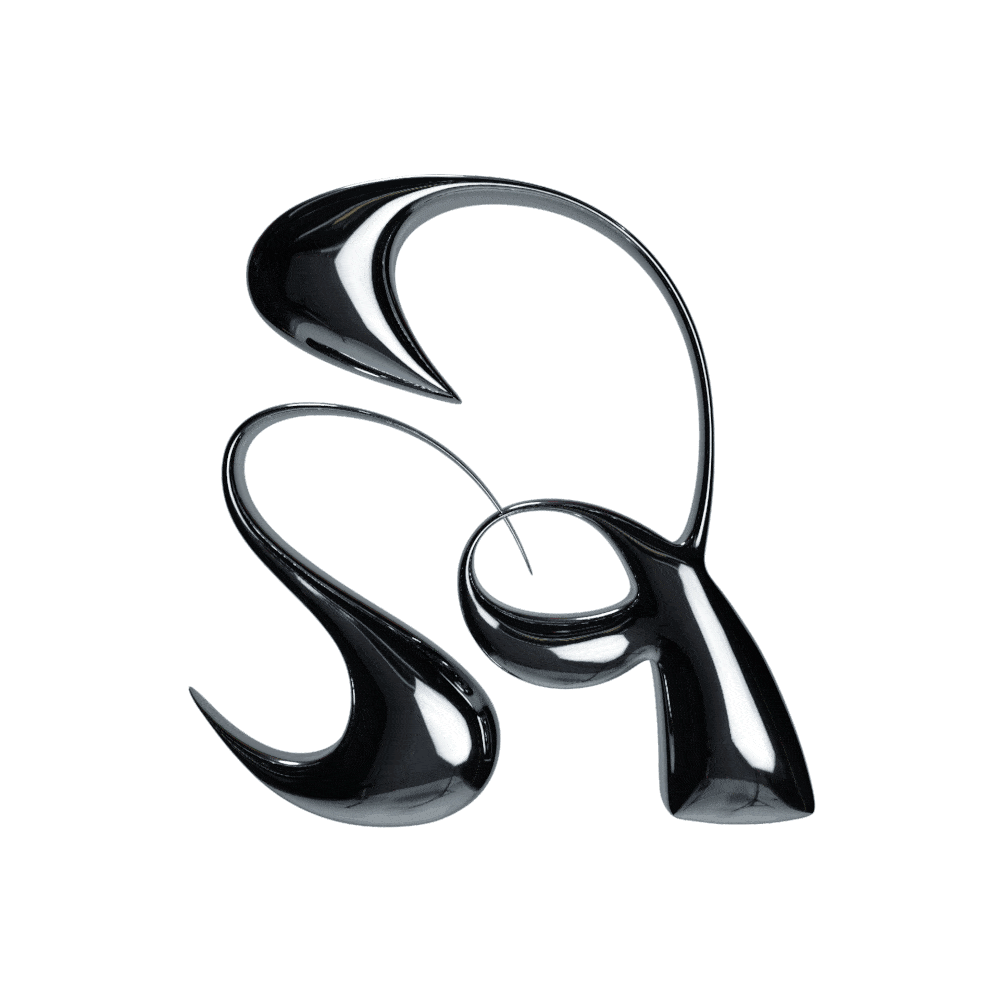![[VP]김재원_1_오프닝](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10/VP%EA%B9%80%EC%9E%AC%EC%9B%90_1_%EC%98%A4%ED%94%84%EB%8B%9D.png)
Visual Portfolio
아티스트의 흥미로운 작업을 파고듭니다
김재원이 전하는 이야기는 방향을 잃은 채 공기 중을 떠다닙니다. 어떠한 결말도 정해지지 않았기에, 그의 작업은 온갖 경계를 무심한 표정으로 가볍게 넘나들죠.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안전한 것과 위험한 것 사이에서 그는 그 틈에 남은 온기의 잔상을 더듬습니다. 희미하게 쌓인 이미지들은 때로는 맑은 거울처럼 세상을 비추다가도, 어느새 누구나 겪는 평범한 순간이 되어 흩어지곤 하죠. 김재원은 그 불안정한 틈에서 생각이 모양을 갖추기 직전의 순간을 포착하려 해요. 의미를 가지기 전의 속삭임, 아직 이름 짓지 못한 감정들. 그렇게 시간과 감각이 희미해진 것들 사이에서 그는 자신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며, 다른 존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작가는 서로를 이어주는 미세한 체온과, 아직 언어로 다 닿지 못한 마음의 흔적으로 우리는 초대합니다. 스쳐 가는 장면을 헤아리다 마주치는 익명의 일상은 누군가에게는 뜻밖의 하루를 선사할지도 모르죠. 밑도 끝도 없이 끊임없이 번져가는 김재원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그 여정을 «비애티튜드» 웹 아티클에서 만나보세요.
![[VP]김재원_2_인트로](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10/VP%EA%B9%80%EC%9E%AC%EC%9B%90_2_%EC%9D%B8%ED%8A%B8%EB%A1%9C.png)
‹어쩌면 멸망을 바랐을지도 몰라 Maybe I Longed for Collapse›, 2025.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영상, 사진, 글을 매체로 작업하는 김재원입니다.
지금의 창작자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어릴 때부터 미술과 음악 등 여러 분야를 배우고 접했지만, 그게 지금까지 작업을 이어오게 만든 이유를 완전히 설명해주진 못할 것 같네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여전히 보여주고 싶은 것과 들려주고 싶은 것들이 있기에 계속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의 작업 공간이 궁금해요. 편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작년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입주를 마친 뒤 현재는 거주 공간에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어요. 사실 생활 공간과 작업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 처음에는 지금의 환경이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지내다 보니 적응의 힘이 크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VP]김재원_3](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10/VP%EA%B9%80%EC%9E%AC%EC%9B%90_3-scaled.jpg)
![[VP]김재원_4](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10/VP%EA%B9%80%EC%9E%AC%EC%9B%90_4-scaled.jpg)
Studio view, MMCA Residency Goyang, 2024.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and MMCA Residency Goyang, 사진: 이미지줌
작가님은 영감을 주로 어디서 얻으시나요?
대체로 제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겪은 사건, 마주한 사람, 그리고 신체가 놓였던 공간들이 그 바탕이 되었어요. 퀴어와 질병을 둘러싼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의 당사자성 역시 하나의 기반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경험이 곧장 영감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시간이 지난 뒤 그 기억을 다시 소환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미지와 얽히며 생각이 구체화되곤 합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겠지만, 작가님은 작업하실 때 어떤 창작 과정을 거치시나요?
제 작업은 대부분 기록처럼 남긴 후, 그것들을 다시 모아 엮어보는 방식에서 출발했어요. 서술이라고 하기엔 장황하지 않고, 그렇다고 단순한 기록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그 중간 어딘가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영상의 경우, 글(스크립트)을 먼저 쓰고 그다음 시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과정이 저한테는 꽤 자연스러웠는데, 평소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떠오르거나 그때 그 순간에 남겨야 했던 단어나 문장 등을 수시로 기록하는 습관이 자리잡혀 있어 그랬던 것 같아요. 어쩌면 텍스트 자체도 쓴다는 것 이전에 수집과 기록하는 감각에 더 가깝게 느끼고 있어요.
다만 작업이 늘 텍스트만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지를 먼저 수집하거나 촬영한 뒤, 거기에서 파생되는 언어가 뒤따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제 작업 전반에서 텍스트의 비중이 크다 보니, 최근에는 그것을 경계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텍스트와 이미지가 서로 밀어내기도 끌어당기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작업이 궁금합니다. 몇 가지 작품을 예로 들어 소개해 주시겠어요?
타이베이에 위치한 C-LAB에서 HIV 상태인 아시아 예술가들이 경험한 HIV/AIDS의 맥락을 해석한 전시 «Incurable Alliance»가 4월부터 6월까지 열렸어요. 본 전시에 선보인 영상 ‹유실물 Lost Belongings›(2025)을 소개하고자 해요.
![[VP]김재원_5](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10/VP%EA%B9%80%EC%9E%AC%EC%9B%90_5-scaled.jpg)
![[VP]김재원_6](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10/VP%EA%B9%80%EC%9E%AC%EC%9B%90_6-scaled.jpg)
![[VP]김재원_7](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10/VP%EA%B9%80%EC%9E%AC%EC%9B%90_7-scaled.jpg)
‹유실물 Lost Belongings›, 2025, single-channel 4K video, color, stereo sound, 10 min 57 sec, video still.
![[VP]김재원_8](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10/VP%EA%B9%80%EC%9E%AC%EC%9B%90_8-scaled.jpg)
‹유실물 Lost Belongings›, 2025, installation view, «Incurable Alliance», Taiwan Contemporary Culture Lab (C-LAB), 2025.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and Taiwan HIV Story Association, 사진: Anpis Foto.
영상에 등장하는 사물들은 전통적인 정물화에서 볼 수 있는 사물들과, 게이 컬처에서 존재해 온 사물들을 조합해 화면 위에 구성했어요. 각 사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용되고, 훼손되거나 망가진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 작업은 사회 바깥과 커뮤니티 안, 두 영역 모두에서 가시화되기 어려웠던 캠섹스(chemsex: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경험한 게이 남성들의 풍경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어요. 구성원이 남긴, 혹은 사용한 물건들에 주목하여 기억과 질병, 나아가 특정 경험이 일상적인 사물 속에 감정과 시간이 머물러 있는 자취를 탐구했어요. 이런 흔적 속에는 절망, 상실, 수치뿐 아니라 욕망과 친밀함 같은 감정도 공존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과 기억의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질문해 보고자 했어요. 그리고 저는 영상 속 펼쳐지는 테이블 위를 사람, 커뮤니티,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모습으로 여겼어요. 그렇기에 모든 사물을 하나의 출연자(Cast)로 간주했고, 실제로 크레딧에 각각의 사물 이름을 모두 표기하기도 했어요.
![[VP]김재원_9](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10/VP%EA%B9%80%EC%9E%AC%EC%9B%90_9-scaled.jpg)
‹유실물 Lost Belongings›, 2025, installation view, «Incurable Alliance», Taiwan Contemporary Culture Lab (C-LAB), 2025.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and Taiwan HIV Story Association, 사진: Anpis Foto.
더하여 ‹유실물›은 언어적인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었던 영상이에요. 이전의 작업들은 비교적 명확한 내러티브와 기승전결을 가진 형태를 취했다면, 이번에는 형식에 대한 고민 끝에 하나의 전환점으로서 다른 접근을 시도했어요. 이야기를 전개하는 대신 감정의 잔재를 중심으로 구성된 파편적인 시 구절들을 병치시켜 쌓아가는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어쩌면 명확한 ‘이야기’가 있는 형태는 아니지만, 오히려 비선형적인 언어와 이미지의 결합이 제가 붙들고자 했던 감정의 구조나 시간의 밀도에 대해 좀 더 많은 실험을 가능하게 했다고 느꼈어요.
![[VP]김재원_10](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10/VP%EA%B9%80%EC%9E%AC%EC%9B%90_10-scaled.jpg)
‹흔적 없는 몸들 Trace-less Beings›, 2024, print on papers, multi-channel video, loop, dimensions variable, installation view, «어둠 아래 우리는 각자», YPC SPACE, 2024.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and YPC SPACE, 사진: 이의록
![[VP]김재원_11](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10/VP%EA%B9%80%EC%9E%AC%EC%9B%90_11-scaled.jpg)
‹흔적 없는 몸들 Trace-less Beings›, 2024, 디테일
게이 크루징(gay cruising: 게이 남성들이 성적 교류나 만남을 목적으로 공공장소나 온라인 공간을 탐색하는 행위)을 주제로 2024년 YPC SPACE에서 진행된 전시 «어둠 아래 우리는 각자»에서 선보인 두 작업도 이전의 형식과는 다르게 접근하기도 했어요. 3편의 영상과 6편의 시로 구성된 ‹흔적 없는 몸들 Trace-less Being›(2024)의 경우 텍스트와 이미지를 분리해 글과 무빙 이미지를 각각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로 다루었어요. 게이 크루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여러 시공간을 오가며 사라진 존재와 관계들을 이야기했다면, ‹남겨진 몸들 Echoing Beings›(2024)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공간의 만남에 더 친숙한 세대의 사람들과 함께 크루징의 정의와 범주에 대해 나눈 대화들을 수집해 하나의 비공식적 장으로 만들기도 하였어요.
![[VP]김재원_12](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10/VP%EA%B9%80%EC%9E%AC%EC%9B%90_12.jpg)
![[VP]김재원_13](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10/VP%EA%B9%80%EC%9E%AC%EC%9B%90_13.jpg)
‹남겨진 몸들 Echoing Beings›, 2024, single-channel video, color, sound, 32 min 16 sec. video still
![[VP]김재원_14](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10/VP%EA%B9%80%EC%9E%AC%EC%9B%90_14-scaled.jpg)
‹남겨진 몸들 Echoing Beings›, 2024, single-channel video, color, sound, 32 min 16 sec, installation view, «어둠 아래 우리는 각자», YPC SPACE, 2024.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and YPC SPACE, 사진: 이의록
두 사진 작업 ‹잔류 상태 Lingering State›(2025)와 ‹어쩌면 멸망을 바랐을지도 몰라 Maybe I Longed for Collapse›(2025)는 모두 식별 상태에 따른 심리적 변화를 탐구한 작업이에요. ‹잔류 상태 Lingering State›는 녹슬고 침식된 금속판의 표면을 클로즈업해 세포나 바이러스의 단면, 혹은 바다에 떠 있는 이름 모를 섬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저는 그 흔적들을 단순한 부식이 아니라, 시간 속에 사라지지 않고 켜켜이 쌓인 감정의 결로 바라봤어요. 반면 ‹어쩌면 멸망을 바랐을지도 몰라 Maybe I Longed for Collapse›는 건물 옥상 위 말 조각상의 거대한 규모를 의도적으로 흐릿하고 불안정한 초점으로 포착해, 현실과 환상, 상징과 균열의 경계가 흔들리는 순간을 관찰하고자 했어요.

‹잔류 상태 Lingering State›, 2025, pigment print, aluminum frame, 37×55 cm (each), installation view, «Ballet with the Devil», PODIUM, 2025.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and PODIUM, 사진: Lok Hang Wu.
![[VP]김재원_16](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10/VP%EA%B9%80%EC%9E%AC%EC%9B%90_16-scaled.jpg)
‹잔류 상태 Lingering State›, 2025, 디테일
![[VP]김재원_17](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10/VP%EA%B9%80%EC%9E%AC%EC%9B%90_17-scaled.jpg)
‹잔류 상태 Lingering State›, 2025, 디테일
최근 작가님이 작업을 통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사건과 장면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 안에는 늘 시간이 얽혀 있다고 생각해요. 시간은 따로 나뉘어 있지 않고 기억의 레이어 속에서 서로 간섭하며 겹쳐지죠.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감각은 개인의 것이면서 동시에 공동체 속에서 공유되고 확장되기도 해요. 그래서 작업을 하나의 의미로 규정하기보다 다양한 시공간 속에서 새롭게 읽히고 개입될 가능성을 지켜보려 해요.
최근 진행한 작업에서 만족하는 부분과 불만족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만들 때는 모르고 지나치거나 어쩌면 모른 척 지나쳤던 것이 비교적 일정 시간이 지나 다시 보았을 때, 그제야 만족과 불만족이 선명하게 드러나고는 해요. 그래서 사실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구분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니에요. 대신 시간이 지난 작업을 종종 다시 보며 그런 차이를 돌아보고는 해요. 다만 이런 평가는 어디까지나 제 스스로의 점검이고, 크게 연연하지는 않아요.
![[VP]김재원_18](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10/VP%EA%B9%80%EC%9E%AC%EC%9B%90_18.jpg)
‹불특정 주인공 Protagonist, Undefined›, 2023, single-channel video, color, sound, 9 min 42 sec, video still.
![[VP]김재원_19](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10/VP%EA%B9%80%EC%9E%AC%EC%9B%90_19.jpg)
![[VP]김재원_20](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10/VP%EA%B9%80%EC%9E%AC%EC%9B%90_20.jpg)
‹불특정 주인공 Protagonist, Undefined›, 2023, single-channel video, color, sound, 9 min 42 sec, video still.
평소 일상을 보내는 방식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일상과 일이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하루의 루틴이 촘촘하게 짜여 있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엉망이 되기도 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에 세 번은 반드시 산책을 나가야 하는 반려견 덕분에 그 구간을 중심으로 운동, 책, 영화, 여러 집안일 등을 이어가며 나름의 리듬을 지키려 하고 있어요. 특히 쉴 때는 집 안 곳곳을 청소하거나 정리를 하는데요. 머릿속이 맑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하루를 더 기분 좋게 열기도, 마무리할 수도 있더라고요.
요즘 가장 큰 관심거리는 무엇인가요?
1. 반려견 건강 관리, 어떻게 잘 돌볼 수 있을지?
2. 스트레스, 어떻게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을지?
3. 몸에 근육은 대체 언제 붙는 건지?
4. 오늘 저녁은 뭐 먹지?
작가님이 삶을 대하는 태도는 작업에 어떻게 묻어나나요?
일상에서 마주하는 작은 균열이나 흔적, 그리고 감정을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두려는 태도가 작업으로 이어져요. 그렇게 일상에서 경험한 것들이 이미지에 스며들고, 또 다른 언어나 장면으로 전환되기도 해요. 그래서 작업은 삶을 따로 재현하기보다는,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스며든 결과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VP]김재원_21](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10/VP%EA%B9%80%EC%9E%AC%EC%9B%90_21-scaled.jpg)
Installation view, «Hazy Scenes», 엘리펀트스페이스, 2023.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사진: 김진현
![[VP]김재원_22](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10/VP%EA%B9%80%EC%9E%AC%EC%9B%90_22-scaled.jpg)
Installation view, «Hazy Scenes», 엘리펀트스페이스, 2023.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사진: 김진현
슬럼프가 올 때는 어떻게 극복하세요?
사실 뚜렷하게 겪었었는지, 또 극복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뭔가 잘 안 풀릴 때는 하루나 며칠 정도 진행 중인 작업에서 살짝 거리를 두고 주변부에 집중하곤 합니다. 그 주변부라는 게 일상의 사소한 것이거나 제가 관심을 두는 다른 것들일 수도 있고, 돌고 돌아 결국 작업의 또 다른 부분일 수도 있겠지요. 어쩌면 작업 과정에서 힘듦은 항상 동반되는 것이기에 슬럼프를 떠나 그냥 하는 것이 아닐까요.
최근 들어 찾아온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인가요?
스튜디오 문제가 가장 커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는 거주 공간에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곧 1년이 되어가다 보니 집인지 창고인지 헷갈리는 이곳에서 나와 이제는 안정된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창작자의 태도와 철학을 알려주시겠어요?
작업 과정에 있어 항상 저 자신에게 많은 엄격함과 의심을 갖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결국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비워둘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부재와 공백이 어떤 것보다 강하게 발화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작업에서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한 번의 작업으로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질문을 이어가며 다시 묻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기도 해요. 작업이 언제나 완결이 아니라 시작점에 가깝다고 생각하면서 그 과정에서 언어와 이미지가 계속 새롭게 맞물리기를 바라고 있어요.
![[VP]김재원_23](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10/VP%EA%B9%80%EC%9E%AC%EC%9B%90_23-scaled.jpg)
‹Nuance›, 2022, screening view, «Day With(out) Art 2022: Being & Belongings»,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2022.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and Visual AIDS, 사진; Filip Wolak
‹Nuance›, 2022, single-channel video, color, sound, 6 min 13 sec. Commissioned by Visual AIDS
좋아하는 것을 지속하려는 다른 창작자에게 건네고 싶은 노하우나 팁을 공유해 주시겠어요?
좋아하는 것을 평생 마주하며 살아가야 한다면, 혹은 그러길 원한다면 그 대상과의 관계도 여러 얼굴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과한 애정을 쏟기도 하고, 가끔은 지독하게 다투어보기도 하면서요. 사람 간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느껴요.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 좋아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 이해가 결국 지속할 힘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아, 작업이랑 어떻게 다투냐고요? 글쎄요…
![[VP]김재원_24](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10/VP%EA%B9%80%EC%9E%AC%EC%9B%90_24-scaled.jpg)
Installation view, «HIV Science as Art», Metro Arts, 2023.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and HIV Science as Art, 사진: Louis Lim.
![[VP]김재원_25](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10/VP%EA%B9%80%EC%9E%AC%EC%9B%90_25-scaled.jpg)
(하단 작업) ‹어제 흐른 물은 내일 흐르지 않아›, 2019, installation view, «Flare», WESS, 2023, 사진: 심규호
![[VP]김재원_26](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10/VP%EA%B9%80%EC%9E%AC%EC%9B%90_26-scaled.jpg)
(오른쪽 작업) ‹침묵으로 생긴 여백 Blank Space Caused by Silence›, 2020, installation view, «After That Blue», Fragment Gallery, 2023.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and Fragment Gallery.
사람들에게 어떤 창작자로 기억되고 싶나요?
솔직하고 맛있는 창작자. 혹은 사람?
현재 품고 있는 이상적인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해가 갈수록 미래를 꿈꾼다는 일이 점점 멀게만 느껴져요. 어쩌면 이상을 그려보는 대신 지금의 상황과 관계를 자주 돌아보게 되곤 하는데요. 몇 년 전, 한 친구가 “좋은 삶과 우정,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라고 본인을 소개했던 말이 가끔 떠오르곤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그저 건강하게, 좋은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작업을 이어가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VP]김재원_엔드이미지](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5/10/VP%EA%B9%80%EC%9E%AC%EC%9B%90_%EC%97%94%EB%93%9C%EC%9D%B4%EB%AF%B8%EC%A7%80.png)
Artist
김재원 (@etc.1)은 영상, 사진, 언어를 매체로 가시성과 기억, 그리고 시공간적 경험이 교차하는 지점을 탐구한다. 그의 작업은 퀴어와 HIV/AIDS를 둘러싼 사회적, 정서적 맥락 속에서 질병 이후 남겨진 잔재와 보이지 않는 관계를 매개로 과거, 현재, 미래가 뒤섞이는 혼재된 시간성을 시각화한다.
개인전으로는 «Hazy Scenes»(엘리펀트스페이스, 2023), «로맨틱 판타지»(공간사일삼, 2021) 등을 열었고, 서울국제대안영상예술페스티벌(서울, 2024), 휘트니 미술관(뉴욕, 2022), 필라델피아 미술관(필라델피아, 2022),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서울, 2021) 등에서 작품이 상영되었다. 이외에도 C-LAB(타이베이, 2025), PODIUM(홍콩, 2025), YPC SPACE(서울, 2024), WESS(서울, 2023),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서울, 2023), Asian Arts Initiative (필라델피아, 2023), 울산시립미술관(울산, 2022) 등에서 열린 전시에 참여했으며, 2024년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입주작가로 활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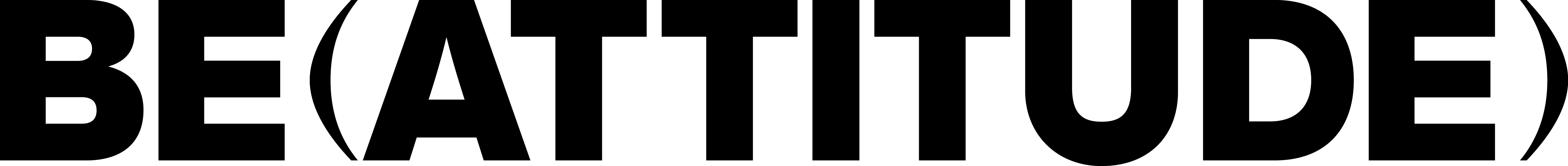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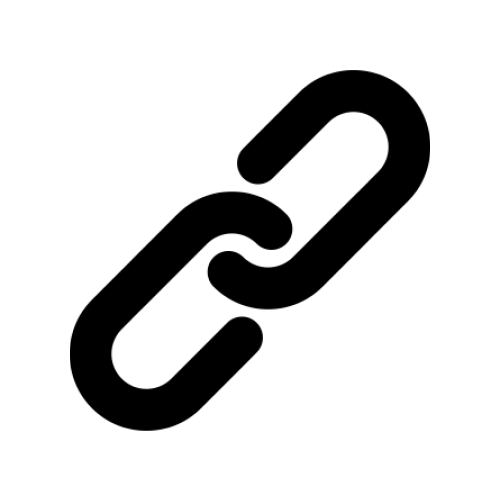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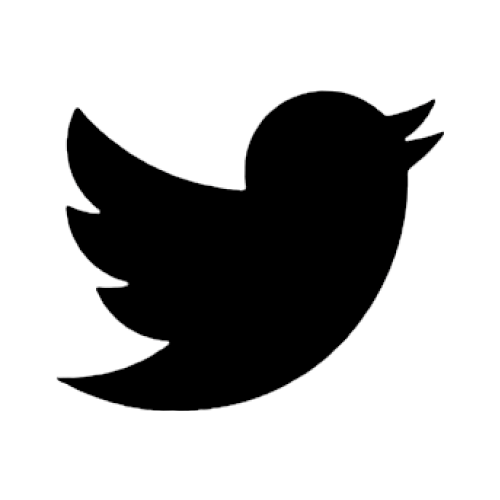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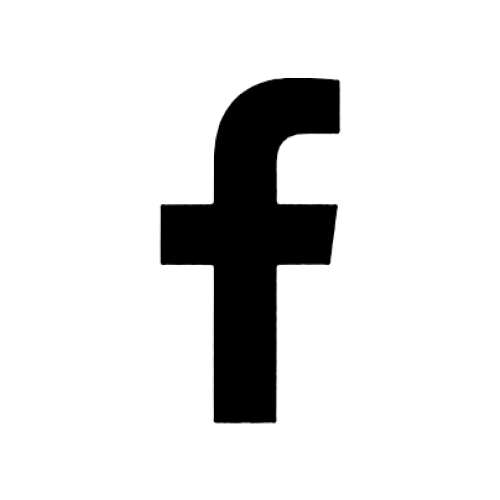


![[BA]섬네일](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6/02/BA%EC%84%AC%EB%84%A4%EC%9D%BC-3-scaled.jpg)
![[BA]섬네일](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6/02/BA%EC%84%AC%EB%84%A4%EC%9D%BC-2-scaled.jpg)
![[BA]섬네일](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6/02/BA%EC%84%AC%EB%84%A4%EC%9D%BC-1-scaled.jpg)
![[review]수퍼플렉스_3](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6/02/review%EC%88%98%ED%8D%BC%ED%94%8C%EB%A0%89%EC%8A%A4_3-1-scaled.jpg)

![[BA]섬네일](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6/01/BA%EC%84%AC%EB%84%A4%EC%9D%BC-4.jpg)
![[BA]섬네일](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6/02/BA섬네일-3-scaled.jpg)
![[BA]섬네일](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6/02/BA섬네일-2-400x600.jpg)
![[BA]섬네일](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6/02/BA섬네일-1-400x600.jpg)
![[review]수퍼플렉스_3](https://magazine.beattitude.kr/wp-content/uploads/2026/02/review수퍼플렉스_3-1-400x600.jpg)